얼마전에 ktx를 타고 지방에 다녀 온 적이 있다. 쏜살같이 달아나는 주변의 풍경들....
오랜만에 탄 기차이기에 어린시절의 향수에 젖어 본다. 초등학교 시절엔 방학때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었고, 중학교 때인가는 기차를 타고
외갓집과 이모집에 놀러가곤 했다.
그땐 기차옆을 지나가는 풍경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었다. 저녁 무렵 멀리 보이는 집에서 올라오는 밥짓는 연기, 깜깜한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불빛의 집....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찻길 옆에 있는 작은 집 속을 기차 안에서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때였다. 집에는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텃밭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먹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전쟁놀이를 하기도 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었다.
<걸 오더 트레인>을 몇 장 읽다보니 옛 추억에 잠기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찻길 옆의 그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
이 책의 이야기에는 일기형식의 날짜가 쓰여져 있다. 레이첼, 메건, 애나, 그들의 이야기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하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고,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흥미롭지 않은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집을 엿보게 되고, 그 집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몇 집 건너 있는 집이고, 그 집에 다정한 부부가 살고
있다면, 그런데, 그 부부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레이첼은 알콜 중독자이다. 그녀도 이전에는 아주 행복한 날들이 있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레이첼은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 놈의 술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출근을 하는 척하면서 통근 기차를
탄다.
통근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신호때문에 잠시 멈춰 서는 구간이 있는데, 그곳에는 철로변의 집들이 몇 채 있다. 레이첼이 남편 톰과 행복하게
살던 23호집.
그리고 몇 채 건너에는 15호 집이 있다. 그 집에 사는 부부가 항상 눈에 들어 온다. 약 1년이 넘게 눈여겨 보아 왔으니 그 지점에 오면
그 집을 관심있게 보게 된다. 다정한 부부를 가상의 이름인 제이슨과 제스라고 칭하면서 (사실은 스콧과 메건)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 본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 그런데, 어느날 레이첼은 그 부부 중의 아내가 다른 남자가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제이슨을 배신한 제스,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같지 않은 그 충격에 레이첼은 술은 마신 후에 그 집이 있는 동네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리곤 다음날 자신이 얹혀 사는 친구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난장판이 된 복도와 자신의 모습. 술주정을 얼마나 부렸으면 이토록 흉칙한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집이 있는 동네까지 간 기억만 있을뿐 새하얗게 기억이 지워졌다.
" 하지만 내 안의 착한 천사들이 이번에도 술에게, 그리고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인격에게
지고 말았다. 주정뱅이 레이첼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독하게 마음이 넓어지고 태평해지거나 아니면 미움에 빠져 버린다. 그녀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 (p. 155)
설상가상으로 그 날 그 시각 이후에 자신이 제시라고 이름을 붙였던 메건이 실종되었다고 하니...
그날의 기억을 조각 조각 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레이첼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메건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살해되었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단서와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어렴풋한 기억을 짜 맞추는 레이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동향.
" 내 머릿 속에 갇혀 있는 기억 때문에 내가 손을 놓치 못하는걸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실히 전하고픈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 p. 268)
이 책은 '폴라 호킨스'가 쓴 스릴러 데뷔작이다. 스릴러 작품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재미는 반전이다. 바로 이 소설의 반전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날을 어느새 잊어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불륜을 저지르는
인간.
뭔가를 비밀스러운 것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인간.
물론, 소설 속의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소설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일기형식의 몇 년, 몇 월, 몇 일, 요일 이라는 형식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형식이 없다고 해도 책을
읽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스릴러 소설이기에 사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평을 인용하자면,
" 호킨스는 화자들의 시점 사이를 능수능란하게 오가며 독자들을 계속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이 시점들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아귀가 들어맞기 시작하며, 긴장감을 팽팽하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라는 평론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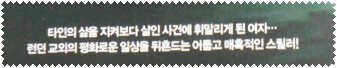
그런데, 스릴러 소설을 읽으면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각 인물이 나오면서 그 시점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 읽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이야기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내려가기 때문이다. 만약 두번째 읽게 된다면 그런 시점을 챙겨 가면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그
시점들이 그냥 페이지를 넘기면서 슬쩍 보고 지나칠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