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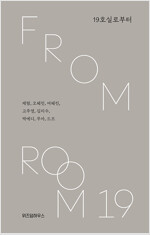
이 작업의 목표는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언하는 것이다.
지구상 가장 거칠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 바다.
많은 것이 공백 상태인 그 광활한 공간에서
인신매매업자와 밀렵꾼, 배를 훔치는 도둑과 폐유 투기범.
쇠고랑을 찬 노예와 파도에 내던져진 밀항자,
공해로 나가는 임신중지 시술자, 수상 국가 건설을 꿈꾸는 사업가,
전 대륙 40만 4,000 킬로미터, 오대양 1만 2,000해리를 넘나든
목숨을 건 취재를 통해 밝혀진 바다의 현재와 미래, 불편한 진실. -무법의 바다
도서관에서 두 권의 책을 내게 사주었다. ('희망도서'라는 밋밋한 말로는 이 기쁨이 다 표현이 안됨) 최근 등산이다 뭐다 무리를 했더니 몸이 그만 지쳐버렸다. 어제 결국 독감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지냈다. 집에 감기약이 없어서 해열제로 버티다가 크림 수프에 양파를 잔뜩 넣어 끓여 먹고 감귤 주스를 투통 정도 마시니 많이 나아졌다. 해열제는 어쩔 수 없지만 감기약 먹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내 몸에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는 기운이 없었는데 책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터 좀 더 힘이 났다. 그래도 아직 몸과 마음이 고장, 수리 중. 블로그를 들어가보니 마침 비슷한 때에 쟝쟝님도 아팠던 것 같다.
https://blog.naver.com/jyanggrim/223228400784 나도 몸살에 두통이었는데...ㅉㅉㅃㅎㅎ

이제훈의 기태 연기는 '햄릿'을 떠올리게 했다.
감정의 섬세한 변화를 이렇게 까지 소화하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
"너만 없었으면 돼."
며칠 전 꿈에 이제훈이 나와서 영화 '파수꾼'을 다시 봤다. 불안과 슬픔을 감추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안 그런척 하기, 센척하기, 밝은 척 하기. 나는 어느 쪽일까. 특히 몸에 문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구는 인간들을 보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에서 기태(이제훈)는 학교에서 일진임에도 절친들을 대할 때는 사실상 누구보다 마음이 여려 보였다. 내게는 이 점이 이 영화에서 가장 놀랍고 신선했다. 친구인 베키(극중 '희준'으로 나오는 박정민의 애칭)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몇 번이나 달래는 모습이 그랬다. 이 장면이 연인 같기도 해서 패러디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교실에서 베키가 기태를 향해 신날하게 퍼붓는 말들, 나중에 또 한명의 절친인 동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일이 커지면서 기태에게 잔인한 말을 던질 땐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 만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다.
너무 당연해서 살다 보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나는 기태가 친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울었다. 정작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가지 이유로 전달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나...말한다고 제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솔직해 지려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필요한 건 말해지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려는 배려가 아닐까. 서로가 그런 마음일 때는 소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한마디로 비극이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 수전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무작정 자신만의 '19호실'을 만든다. 매일같이 그곳을 드나들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머지않아 수전의 남편이 그 공간에서 수전이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의 진실은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수전은 '19호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 -19호실로부터


아직도 이 소설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 소설을 읽다가 중간에 덮었던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있긴 있었겠지만..) 나는 그러질 못했다. 에미와 레오가 주고받는 편지를 읽으며 어느 순간 편지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잘 못 전송된 메일, 그러다가 이어지는 대화,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친구를 그에게 소개해 준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내 앞 종이 책에 펼쳐지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 점이 소설의 매력이고 장점이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 읽었던 '블랙박스'가 몹시 생각나는 소설이기도 했다. 서로 너무 다름에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간체소설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가난한 연인들'이 그렇고 '블랙박스'가 그랬고,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도 그랬다. 이런 소설이 내게 두 권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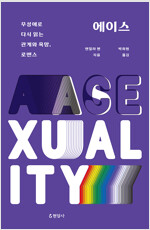
에이스를 읽는 중인데 영국에 '네이키드 어트랙션'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주인공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 참가자들이 박스에 벌거벗은 채 들어가 있고 발부터 점점 위로 신체가 노출되며 '선택'을 받거나 탈락하는 거라고. 맙소사. 대놓고 외모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묘사하는 점이 유치하기 이를데 없다.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과 편지로 오래 대화를 이어가다가 만나는 건 가능한데 맨 몸을 구석구석 살피다가 데이트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둘 중 한 가지만 해봤으니 나도 여기에 대해 뭐라 단정하긴 힘들다. 외모든, 대화든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는 건 어차피 불가능 한 일이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적어도 내 경우는 그렇다.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나를 찾아냈고, 나를 알아봤어요. 그 사람은 나를 내 은신처에서 끌어냈어요. 나는 그 남자의 에미예요. 나는 레오의 에미라고요. 내 말 못 믿겠어요? 증명해줄까요? ... 아니요, 레오, 베른하르트에게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았어요. 다만 내 자신이 두려울 뿐이었죠.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
에미: 레오, 당신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 해줘요.
3분 뒤
레오: 글 쓰는 것과 비슷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