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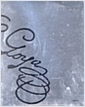
-
고야, 영혼의 거울 ㅣ 다빈치 art 18
프란시스코 데 고야 지음, 이은희 옮김 / 다빈치 / 2001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다빈치라는 출판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미술 관련 서적을 많이 낸다. 이 책은 고야에 관한 책으로, 나처럼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이다. 고야는 궁정화가로 활약하는 등 순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낀 듯하다. 학정에 시달리는 스페인을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알고보니 프랑스군은 그보다 더한 학살자였던 거다. 고야의 그림 중 내가 알 정도로 유명한 '5월 3일'은 그래서 나왔다. 그 후 그는 속세를 조롱하는 작품들을 많이 그리는데, 이 책에는 '카프리초스'라는 판화집의 모든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를 알아맞추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 80점의 그림 중 내가 그 의도를 짐작한 작품은 다섯개도 안된다. 그래서 아쉽다기보다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의 반여성적인 태도가 맘에 걸린다.
판화집 19번은 날개를 단 남자들이 날고 있고, 아래는 여인들이 모여 남자들의 털을 뽑고 있다. 해설은 이렇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패가망신하는 남자들을 풍자했다' 20번은 털을 모두 뽑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 다른 남자가 또 오니 쫓아 버리라는 해설과 함께. 26번은 의자를 머리에 쓴 여자 둘이 나오며, 해설은 '경박한 여인네는 앉을 의자를 가지고도 머리에 쓸 생각밖에 안한다' 36번, 폭풍우에 시달리는 여인이 나오며 '놀고 싶어하는 아가씨들은 집에 처박혀 있기를 싫어해 이런 고생을 사서한다'
대충 이런 식이며,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에는 언제나 놀고 있는 아가씨들이 나온다. 여성들이 잘되는 꼴을 못보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손석춘과 이문열이 페미니즘을 '성적 방종' 어쩌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또하나. 고야가 훌륭한 화가이며 화가가 그림만 잘그리면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글을 너무 못쓴다. 그의 친구 마르틴(남자다)에게 보냈던 편지가 책에 실려 있는데, 그걸 보니 하두 한심해 한숨이 나온다.
[우린 서로 편지를 쓰지 않지, 정말이지? 자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 정말이지? 자네도 재미가 없고 나도 그렇네. 정말이지?....자네는 자네의 거시기를 애무하는군. 정말이지? 자네는 결혼하지 않아 철이 없네, 정말이지?]
고야, 너 바보지, 정말이지? 얘는 꼭 '사랑하는 마르틴에게'라고 편지를 시작한다. 편지 내내 보고싶고 어쩌고 그런 말이 써있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다. 아내의 '출산이 빨라져 우리가 더 빨리 볼 수 있게되어 좋다'고. 그렇게 본다면 Bisexual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지 뭐. 이런 편지도 있다.
[사랑하는 마르틴, 잘 있게나. 시간이 없네]
후후, 우표가 아깝다.
[왜 편지를 안보네나. 이 무심한 사람아. 사실 할말은 많으나 모두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네. 부디 욕먹을 짓은 하지 말게나. 자네가 나를 보고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자네를 그리워하고 있다네. 그러니 이 편지지를 외면하지 말게나]
대충 이런 식인데, 읽다보니 내가 초등학교 때 썼던 편지 같다. 내가 고야보다 그림은 못그리지만-많이 못그리지만, 아니 비교할 수 없지만, 고야보다 술도 잘 마시고-이건 내 생각이다-편지는 잘쓴다. 대가보다 뭐 한가지 잘하는 게 있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책값이 쓸데없이 비싼 게 흠. 표지가 은박지로 번쩍거리고, 그림은 쓸데없이 크게 실었으며, 해설이 빈약하다는 게 나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