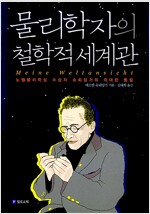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불멸의 업적을 쌓은 에르빈 슈뢰딩거의 철학 에세이. '길을 찾아서'라는 이름이 붙은 1부는 1925년 가을, '무엇이 실재인가?'라는 이름의 2부는 1960년에 쓰였다. 이 두 기간 사이에 슈뢰딩거는 그의 이름이 붙은 방정식을 발표하고, 나치를 피해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오랜 망명 생활을 했다.
같은 오스트리아인인 비트겐슈타인이 형이상학에 사형선고를 내렸음에도, 그는 시침 뚝 떼고 형이상학을 논한다. 사실 주요 주제인 의식과 자아의 문제가 꼭 형이상학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다.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부분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철학으로 보든 과학으로 보든, 당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이 주제에 대해 슈뢰딩거는 그의 과학적, 신비적 통찰을 기반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그도 인정하듯이 이 주제에 대한 그의 논의는 논증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비유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흥미로운 의견이자 통찰이지만 미완성의 느낌이 있다. 뒤의 해제를 붙인 장회익 교수의 말처럼, "진정한 보배"인지 "보배처럼 보이는 돌덩이"인지 판별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처럼 보인다. 어쨌든 슈뢰딩거의 이 짧은 철학 에세이 모음은 역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이 에세이의 주요 주장은 별개로 보이는 자아, 의식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가 천착했다는 인도 철학(베단타 철학)의 영향이라고 한다. 삶은 죽음을 넘어 끝없이 이어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내가 어제의 나와 하나의 의식인 것처럼, 나의 의식과 조상의 의식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도 역시 하나이다. 그가 얘기하는 이 '우주의 의식'이 감이 잡힐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다.
그는 1961년 1월, 73세의 나이로 고향인 비엔나에서 영면에 들었다. 그의 의식은 지금도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
[*] 장회익 교수는 다듬으면 보석이 나올 원석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자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물리적 사건들과 (그 특수 유형으로서) 지성적 사건들로 이루어진 무한한 사슬이 놓여 있다. 그 사슬의 하나의 마디인 자아는 그에 속하면서도 그에 역작용하면서 그 사슬을 연장시킨다. 자아는 자기 몸의, 특히 두뇌 체계의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과 전승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사슬로 연결된다. 그중에서 이러한 교육과 전승은 말, 글, 기념물, 관습, 생활방식, 새로 형성된 주변 환경에 의해 생겨난다. 이처럼 수천 개의 단어와 용어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모든 것을 통해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사슬과 연결된 자아는 단지 이 사슬의 산물이 아니다. 자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슬과 동일한 것이고 사슬의 엄밀하고 직접적인 연속이다. 이는 쉰 살의 자아가 마흔 살의 자아와 연속인 것과 같다.
[...] 자아는 출생을 통해 비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흡사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내게는 나의 희망과 분투, 공포와 근심이 내 이전에 살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것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어도 좋으리라. 수천 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즉 바로 지금, 내가 처음 기원한 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내 안에서 움트는 모든 생각은 이전의 어느 조상이 가졌던 생각의 연속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실상 어떤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이 아니라, 태고의 성스러운 생명수生命樹에 있던 어떤 싹이 예정대로 발현하는 것이다. (51~5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