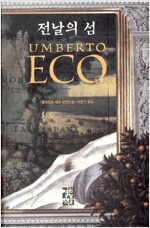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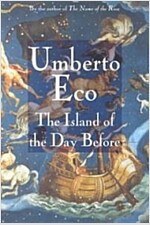
<전날의 섬L'isola del giorno prima>은 움베르토 에코가 1994년에 이탈리아어로 출간한 책이다. 영역본은 1995년에 출간됐으며(위 오른쪽), 우리말 번역은 1996년에 상, 하 2권으로 출간됐다가 2001년에 한 권으로 합쳐져서 다시 출간됐다(위 왼쪽). 우리말 번역은 이윤기 선생이 했다. 전반적으로, 에코의 박식함에서 우러나는 끝없는 너스레와 여러 언어를 오고 가는 문장들을 잘 번역했다는 평을 받는다. 번역본에 가끔 어려운 한자어가 튀어 나오는데, 이조차 뭔가 원래의 에코를 읽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쳐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실 에코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그 역사적 배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르는 것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 한자어도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한자가 병기되어 있어 대충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처음 접한 낯선 한자어의 예시이다:
“현장(舷墻)으로 기어오르고, 색구(索具)를 따라 기어가다가...” (13 페이지)
이런 장애를 넘으며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면 읽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읽으며 당연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거나 조사가 맞지 않는 등의 경우이다. 뭐, 두꺼운 책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독자는 찾는데 편집자는 못 찾는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이다. 편집자가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을 만큼 급히 출간했든지, 아니면 편집자가 성의가 없는 경우이다[*]. 여러 출판사에서 이미 출간된 많은 세계문학이 쌓여 있을 텐데, 새 책만 내려고 하지 말고 지난 책이라도 다시 낼 때에는 오류는 바로 잡으면 좋겠다. 다음은 고쳤으면 싶은 오류의 예시이다:
“<다프네> 선상에서 회고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로베르토가 카살레에서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한 무수한 사건에 시달리면서, 우주를 덧없고 불가해한 부조리로 파악한다.” (207 페이지)
“하지만 나의 지리학적 관심과 그의 역사학적 관심을 별개다.” (360 페이지)
위의 문장들은 거슬리긴 하지만 그냥 고쳐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이윤기 선생의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한다.
“백설같이 흰 옷으로 나무는 창백하게, 주변의 풍경은 은빛으로 물들이는 숲의 여왕이 상복에 가려진 섬의 산꼭대기에 나타나려면 더 있어야 했다.” (154 페이지)
위의 문장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여러 번 읽으니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 할지 알 것 같다. 영역본은 이렇다.
“The queen of the forest, who in snowy dress whitens the woods and silvers the countryside, had not yet appeared above the peak of the Island, covered in mourning.” (p. 107)
“백설같이 흰 옷으로 나무는 창백하게, 주변의 풍경은 은빛으로 물들이는”의 전체가 “숲의 여왕”을 꾸며주는데, “창백하게” 다음의 쉼표가 제대로 된 이해를 방해하는 듯이 보인다. “백설같이 흰 옷”은 여왕이 입고 있는 것이다. 달이 뜨면 풍경이 하얗게 물드는 모습을, 하얀 드레스(“백설같이 흰 옷”)를 입은 “여왕”이 나타남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도 있다.
“...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으려면 그저 믿는 수밖에 없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유 사상의 신봉자에게도 도그마 노릇을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다프네>의 목적은 경도 180도, 즉 솔로몬의 섬이 지나가는 지점이라면, 나의 평결이 솔로몬 왕의 평결같이 명쾌하다면, 우리의 솔로몬은 솔로몬 제도 중에서도 가장 솔로몬적이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아기를 토막 내었듯이, 문제의 핵심을 일도양단(一刀兩斷)해야 한다는 것이다.” (360~361 페이지)
너스레인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 영역본은 다음과 같다.
“... if you would listen to stories—this is dogma among the more liberal—you must suspend disbelief.
So: the Daphne was facing the one-hundred-eightieth meridian, just at the Solomon Islands, and our Island was—among the Islands of Solomon—the most Solomonic, as my verdict is Solomonic, cutting through the problem once and for all. (p. 260)
우리말 번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자유 사상의 신봉자”에게 도그마가 되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려면 불신은 잠시 내려놓아야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나오는 에코의 너스레는 이렇게 이해된다: <다프네>가 경도 180도를 마주하고 있고, 거기에 (소설 속의 인물들이 믿듯이) 솔로몬 제도가 있다면, 지금 이 섬은 솔로몬 제도의 섬들 중에서 가장 솔로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일도양단하는 내 평결이 솔로몬적이듯이.
마지막으로, 핵심적이지만 우리말 번역이 부정확한 부분은 이 책의 핵심 소재와 관련이 있다. 17세기, 유럽인들의 대양 항해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아무런 지형이 없는 바다에서의 위치를 찾는 문제를 이 책은 다루고 있다. 지구라는 구체 위에서의 위치는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적도로부터 남북으로의 위치는 위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며, 위도는 별이나 태양의 높이를 측정하여 비교적 정확히 구할 수 있다. 문제는 경도인데, 경도는 기준 경선(본초 자오선prime meridian)으로부터 얼마나 동 또는 서로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한 바퀴(360도) 회전하므로, 1시간의 차이는 경도 15도에 해당한다(360도/24시간 = 15도/시간). 이 말은 기준 경선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현재 위치한 곳의 시간과 비교해서 경도를 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기준 경선이 정오이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오전 9시라면, 난 기준 경선에서 45도(3시간 차이) 만큼 서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시계가 항해에 필요하며, 이를 둘러싼 경쟁과 암투가 <전날의 섬>의 배경이 된다.
책은 특히 기준 경선(본초 자오선)에서 180도 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기술한다. 기준 경선에서 180도 떨어진 경선은 대척 자오선(antipodal meridian)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잘못된 번역이 눈에 띈다.
“... 타베우니 제도는 화산도(火山島)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로베르토가 서쪽에서 본 것 같은, 꽤 큰 섬도 있다. 그러나 카스파르 신부가 로베르토에게, 결정적인 경선, 말하자면 본초 자오선이 바로 그 섬 바로 앞을 지난다고 주장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 경선의 서쪽에 있다면, 타베우니 섬은 동쪽에 있는 것이지 서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로베르토가 묘사하고 있는 섬을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동쪽에는 작은 섬(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콰메아 섬)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본초 자오선은, 이 이야기의 섬을 보는 사람의 등 뒤로 지나가게 된다.” (359~360 페이지)
역자는 문제의 경선(“결정적인 경선”)을 “본초 자오선”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는 본초 자오선이 아니라 “대척 자오선”이다. 영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The outline of Taveuni shows a volcanic chain like the large island Roberto saw to his west. Except that Father Caspar had told Roberto that the fatal meridian passed just in front of the bay of his Island. Now, if we find ourselves with the meridian to the east, we see Taveuni to the east, not to the west; and if to the west we see an island apparently corresponding to Roberto’s description, then we surely have to the east some smaller island (my choice would be Qamea), but then the meridian would pass behind anyone looking at the Island of our story.” (pp. 259-260)
여기에 prime meridian이란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 “타베우니 제도”는 “타베우니 섬”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지도를 찾아보면 타베우니 섬은 피지Fiji에 있는 섬의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이 좀 부정확한 것들만 넘기면 읽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역본이든 국역본이든 에코는 어렵지만, 참고 읽으면 역사적 배경에 더한 나름의 지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 난 출판업계에서 일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정확히 모른다. 단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