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스크바에서의 오해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최정수 옮김 / 부키 / 2016년 9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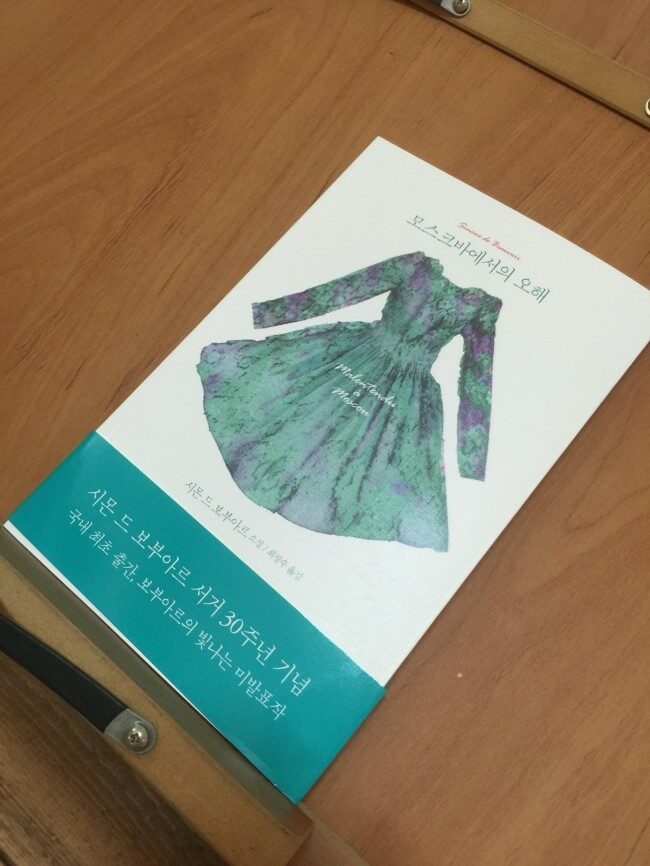
나는 '통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나만의 감각은 아닐 테지만 말이다.
통한다는 게 비슷하다거나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가 끌린다는 말처럼 같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 통한다는 건 뭘까?
앞뒤 다 자르고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적어보기로 한다.
통한다는 건, 서로에게 이해의 여지를 둔다는 거다.
이해의 여지를 둔다는 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자기 뜻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상대만을 찾아다니는 비겁한 부류도 존재한다.
반대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서로를 너무 아끼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기에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다투게 되는 일이 늘어나는 사람들 말이다.
덜 사랑하고, 덜 이해하기에 덜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싶기에 더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소설 <모스크바에서의 오해>는 후자의 이야기다.
그들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해하고 싶고, 너무 함께 하고 싶었기에 오해를 하고 다투게 된다.
사르트르라는 거대한 지성의 동반자로 생을 함께 했던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여성의 첫인상이 된 이 소설은 너무 귀엽고, 애틋해서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청춘들의 이야기처럼 읽히기도 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모스크바에서의 오해>에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출간 소식을 듣고 마침 서평단을 모집하기에 신청을 했더란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아이고, 이거 떨어졌구나."하고는 다른 책을 사며 함께 사버렸다.
책이 도착하고, 읽기 시작한 다음 날 한 권의 책이 내게 왔다.
그 책의 제목도 <모스크바에서의 오해>였다.
하루 늦게 받은 서평 도서였다. 그렇게 이 책은 두 권이 된 거다.
이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느껴진 건 <모스크바에서의 오해> 속 주인공들처럼 사소한 일(서평단 당첨 공지를 확인하지 않은) 하나로 내 쪽에서 일방적인 오해를 하게 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60대의 노부부가 러시아로 이주해 살아가는 딸의 집에 한 달 일정의 휴가를 보내기로 한 데서 시작된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에게 몰두하고, 사랑하기에 지치지 않았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라 더 함께 있고 싶고,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 조금의 양보와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었다.
남편 앙드레는 더 돌아다니고 싶고, 러시아의 풍경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아내 니콜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걸 알기에 자제한다. 니콜은 니콜대로 러시아나 모스크바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앙드레가 좋아하기에 기꺼이 동행한다. 그런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앙드레가 얘기도 없이 일정을 10일이나 늘인 데서 생겨났다.
앙드레는 자신이 얘기를 했고 니콜도 동의했다고 말했지만, 니콜은 앙드레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자신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당신은 좋은지 몰라도 너무 지루하다고 말해버렸던 거다. 두 사람은 하마터면 별거까지 가게 될 만큼 크게 다투는데 그 상황을 해결한 건 정말 사소하고 단순한 방법, 잠시 동안의 대화였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꺼내지 못하고 참다가 한 순간에 터뜨려서 서로 당황하고 화를 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기에 이 책 속의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을 거다.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다.
바빠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하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런저런 상황이나 조건, 동정에의 호소, 일방적인 요구.
대화는 너무 많은 이유로 봉쇄되고 오해는 그 몸피를 끊임없이 불려 간다.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사실 단순하고 간단하다.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잠시 동안의 대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 쓰는 이들이라면 아주 잠시 동안의 대화로도 많은 것을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니콜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한다.
"많은 부부가 그렇게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근근이 살아간다. 고독 속에서. 나는 혼자다. 앙드레 곁에서 나는 혼자다. 그리고 그것을 납득한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납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느끼는 고독은 그 사람이 소중할수록 급격히 커진다. 그 납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달콤하지도 않을 거라는 건 뻔한 일이다.
니콜과 앙드레, 두 사람은 서로를 몹시 사랑하지만 서로에 대해 크고 작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하나의 예로 나이 듦에 대해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는 장면이 있다. 니콜은 앙드레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으며 나이 듦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는다. 반대로 앙드레는 자신보다 니콜이 나이 듦에 대해 덜 불편해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당신은 좋겠어. 변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질투와 원망을 담아서. 조금의 실망과 함께.
이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의 대화는 소꿉놀이 중에 다투는 어린아이들을 닮아있다.
"당신에게 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니콜이 말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난 팍삭 늙어버렸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아주 작은 불만도 견딜 수가 없었지. 당신은 나이를 느끼지 않겠지. 하지만 난 느껴."
"오! 나도 나이를 느껴." 앙드레가 말했다. "심지어 나이 생각을 자주 한다고."
"정말이야?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 "당신을 슬프게 하기 싫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
(중략)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야, 그녀가 생각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부 사이에는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우리 관계가 망가졌을까 봐 조금 두려웠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야." 그가 말했다. "우린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
"그래, 맞는 말이야. 다음번엔 겁내지 않을 거야."
이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려울까를 생각해보면 '겁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가 위축되고, 상대에게 '이해를 구해야'하는 '약자'가 되는 게 겁나고, 얘기를 했을 때 이해받지 못할까 겁나고, 얘기하고 나서 후회할까 겁이 나고, 지금의 관계조차 깨질까 봐 겁내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날까.
더 이상 겁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걸 겁내지 말아야겠다.
이 짧은 소설, 너무 쉽고 간단히 읽히는 이야기는 내게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대화를 많이 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게 대화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허락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언제나 오해는 대화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 사랑해야 하고.
이제, 시몬 드 보부아르의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시작할 결심이 섰다.
마치 짧은 대화를 나눈 기분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