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은 분열된 이야기, 하지만 찬찬히 보면 연결된 이야기.
1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장 3~4절)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나카자와 신이치의 카이에 소바주 시리즈 중 하나인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이 책에는 위에 언급한 성경 구절과 연관된 소설 <어린 사환의 신(1929), 시가 나오야 작>이 논의의 중요한 길로 제시된다. 신이치는 모스의 증여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 소설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나는 신이치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알만한 이야기다. 한 어린 사환이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고 싶어하는데, 자신에겐 그 초밥을 먹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 모습을 본 A는 사환의 사정을 알고 돕고 싶어한다. 그런데, A는 이 사환에게 자신이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싫어한다. 어떤 댓가를 바라지 않겠다는 뜻, 자신이 돕는 사람인지 몰라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난 후, 사환 몰래 그가 배불리 먹을 초밥 값을 초밥집 주인에게 주고, 뛰쳐나온다. 소년은 생각한다. 이런 선물을 준 그는 과연 누구일까? (심지어 사환은 그를 신의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서 더 빠지면 신이치가 마련해놓은 사유의 길로 가게 된다. 여기서 잠시 중단)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A가 느끼는 괴로움이다. 길지만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A는 묘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은 얼마 전에 소년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동정을 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연히 기회가 주어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소년도 만족했을 터이고, 그러니 나 자신도 만족해도 좋을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나는 당연히 어떤 기쁨을 느낄 만한 자격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왜 이렇게 묘하게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느낌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마치 남몰래 나쁜 짓을 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어쩌면 나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우쭐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본래의 진정한 마음이 그런 의식을 비판하고 배반하고 비웃기 때문에 이런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 자신이 한 일을 좀더 가볍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구속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적어도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좋을 듯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23쪽)
인터넷에 이런 고민을 고백하는 한 유저의 글이 올라왔다고 치자.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님 좀 짱^^!"이란 덧글을 달며, 그의 선행을 응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이 글이 어느새 그 날의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고, 어떤 사람이 그 게시물을 뒤늦게 읽어본다."아니, 뭐 도와주면 도와준거지. 이런 것도 엄연히 자랑 아니야. 쳇". 물론 예상 가능한 반응이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와 착함을 덧붙인 지금 이 시대를 비판하는' 자선파티의 정치경제학'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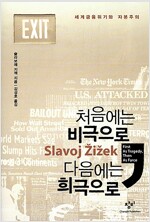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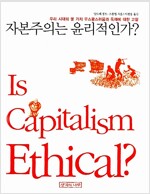
착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요즘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온다. 읽고 있는 여러 저널에도, 또 알라딘을 비롯해 주요 서점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채우고 있는 몇몇 책들의 테마도,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 내가 썼던 <윤리적 소비와 인간미를 판매하기>(http://blog.aladin.co.kr/717962125/3950531)와 연결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 생태 자본주의, 문화적 자본주의, 자본주의화된 사회주의. 지젝부터 스퐁빌까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헷갈린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심심한 참에 잘 되었다고 달려들거나,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 같다. 유명한 영화 감독의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자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착해져서 당황스럽다고. 며칠 전 지인이 사는 어느 신도시의 거리를 같이 걷다가,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사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동네 뭔가 있어. 사람들이 다 있어 보이는데, 뭔가 다들 선하고 여유로워 보여" <어린 사환의 신>에서 A는 어린 사환을 돕는 것까지 모자라, 아예 그 도움 자체로 괴로워하고 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누구는 돌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실행한다면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돌을 맞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일단 고개를 숙이고, 가면을 벗길 준비를 한다.
3

종영된 KBS 드라마 중 <부자의 탄생>이란 작품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드라마였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그려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 걸? 이 드라마는 결국 부자가 되고 싶은 한 가난한 사나이가 결국 부자였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스토리다. 결국 부자의 아들이었던 자는, 가난한 자의 삶에 잠시 내려온 것 뿐. 여기서 드라마는 부자가 되는 방법 대신 혈연으로 모든 것을 덮는다. 남는 건 이시영이 보여주는 부자의 삶에 대한 희화화. 결국 서민들이 부자의 삶에 깊게 다가가는 길이란 없다. 이 드라마는 애초의 목표를 시원하게 배신하면서, 그저 부자를 바라보라고 한다. 아니면 정말 부자는 우리 시대의 '로또'인 것이다. (당신이 이 로또를 맞기 위해 쇼핑몰을 차린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잘나가는 쇼핑몰 CEO 대신, 홈페이지 만들고, 거래처 조금 잡다가 종 치는 CEO들이 수두룩하니까) 결국, 우리 시대의 서민이 던지는 최고의 항의는 <서울의 달>과 같은 서민들의 드라마를 제발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부자들을 구경하는 시대의 비극이다. 그리고 정녕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가게끔 만드는 미디어의 책략. 분석 대신 분노와 투영만이 깃든다.

4

자본주의는 정말 사회적 나눔으로 인해 발산되는 소모의 쾌락, 소모됨으로써 솟구치는 오르가스무스의 길을 자신의 생애에서 최고의 목표로 삼았는가? (그래도 정액은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모되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정액.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자본의 현실 아니겠는가) 조르주 바타이유를 꺼내오자면,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 조금 비튼 상태로 함부로 / 거칠게 원용하자면, 이 착한 부자들의 원천은 '파괴'일 것이다. 이 파괴의 의미를 돈으로 연결짓자면, '써도 또 써도, 그 '씀'으로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 자들. '자선파티의 정치경제학'은 여기서 '기부의 이면'을 보라고 충고한다. 가령 구조조정 뒤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문제. 구조조정을 한 B로 인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B의 기부금으로 인생을 미약하게 연명하거나, 아니면 그 기부금이 전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B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심지어 그가 한때는 사회주의자였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황당함 이상의 반응들을 세심하게 펼쳐볼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반응이, 다른 한 쪽에서는, 여러분 지금 그거 달다고 덥썩 물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독이 든 과일이 될 거에요,라고 경고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지 않은 길'은 무엇일까. 혹자는 강경하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어투로) 자본주의의 착함 운운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결국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그 기술의 유해와 이로움은 사람의 사회적 사용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자체의 사회적 활용을 우리가 잘 해야하는 문제로 덮을 수 있는 것일까?

5
그렇다고 우리가 가면을 벗기기 귀찮아서 / 힘들어서 랩으로 이 자본주의 녀석의 얼굴을 꽁꽁 싸매어, 자본주의 자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은 섣부르고 뜬금없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다 인류학적인 태도. 손과 발에 달린 눈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매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믿는 쪽이다. 그들이 확실한 대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 조각들이 모였을 때, 우연의 힘은 냉소로 시작했던 의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 하지만. 이런 내 소심한 결론 뒤에 숨은 하나의 확신. 자본주의가 착해서 그렇다, 나빠서 그렇다에서 우리가 시원한 아이스크림같은 대답을 먹고 싶어한다면, 우리는 가장 맛있는 부위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알고 후회한다는 것이리라.
다만, 앞에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좌파에겐 상당히 신랄한 꾸짖음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자 한다. 여기엔 물론 나만의 비유와 비약이 들어간다. 양해를. 이 시대의 좌파(왼손)들은 정말 우파(오른손) 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기 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서, '잘 안다는' 문제는 사회를 바라보는 감정과 시선의 차원, 앎의 누적에서 오는 교만함과 그 교만함을 어리광부리는 태도로 바꾼 냉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 때, "오른손이 왼손이 보도록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차원의 문제, 그래서 오른손은 결국 속물이었어라고 못박아 버리게 만드는 유혹. 이때 좌파들이 왼손과 오른손의 일 모두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신'의 경지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것은 아닌가,하고 우려를 표하게 된다. 정작, 자신은 사람으로서 왼손과 오른손의 일로 분열하고 있는데, 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는 사람들. 그 전지전능함의 최후는 무엇일까. 그들이 착한 거북이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의 겸양된 시안으로 지면들, 페이지들, 쪽들을 채울 때. 나는 그들이 "사실은 나 저기 가 있는 토끼인데.."라고 위안을 삼은 채 거북이 행세를 하는 것 같아 두렵다. 토끼가 거북이와 개미의 기믹까지 다 먹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착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지극히 '문제적'이다.
A를 신으로 생각하려는 어린 사환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정작 들려주려고 하는 나는, 이미 이런 이야기 다 끝난 것 아니요,라는 오판으로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해석을 할 줄 아는) 내가 신이야"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사이, 인간은 운다.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자위를 하는 게 이제 이 삶의 낙인가,라는 찬 바람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리고 이 사회가) 확성기를 대고 설파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삶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냉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잡한 문제에서 오는 쾌락을 맛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즘 그래서 '착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첫 걸음을 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는, 냉소라는 지옥에서 탈출하기다. '착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때마침 필요했던, 그 심심함을 달래줄 고마운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정말 우리에게 닥칠 불안한 미래인 것일까? 우리는 이 논의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사랑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것을 택하겠다고. 다시,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다. 굿바이! 미스터 냉소주의.
먼 길을 돌아간 이야기, 결국 나에게로 돌아갔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