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앤드루 포터 지음, 김이선 옮김 / 문학동네 / 2019년 5월
평점 : 


앤드루 포터. 데뷔작 하나로 굉장한 입소문을 만든 장본인이다. 원서가 먼저 생겨서 원서로 먼저 읽었다. 그냥 쭉쭉 읽어나갈 정도로 쉽다. 간간이 폴 오스터가 떠오르기도 하고. 쉽지만 다시 돌아가서 되읽게 되는. 쭉쭉 읽어도 빨리 읽는다는 뜻은 아닌. 그러다 보니, 작가가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에 눈길이 간다.
번역서를 이제 구했다. 읽다가, 어쩐지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하는 부분에서 멈춰졌다.
쉬운 표현인데도, 야, 이런 느낌 좋다...하던 부분이어서.
원문은 이렇다.
[It's drought season in Virginia. No rain in two weeks and the temperature is in triple digit, predicted to top out at 105 by evening. The late afternoon air is gauzy, so thick you can feel yourself moving through it and when I squint, I can actually see the heating rising in ripples above the macadamia driveway.]
이미지의 향연. 그것도 무지하게 평이한 단어들로만. 그러니 대단하다 하는 거겠지.
이미지를 따라가 보자.
버지니아 가뭄철. 버지니아에선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여름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습기가 일도 없다. 그냥 이러다 살이 타겠구나...싶은 지경이다. 버지니아는 습기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2주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단다. 바싹 말랐다. 게다가 뜨겁다.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퐁퐁 피어나는 게 절로 그려진다. 바로, 그런 이미지다
어찌나 뜨거운지, 온도가 세 자리 수란다. 여기서 무작정 '온도가 세 자리 수'라고 하면 한국 독자들은 '으잉?'하지 않을까? 미국의 날씨 온도 단위는 섭씨가 아닌 화씨가 일반적이라 '화씨로' 세 자리 수란 이야기겠지. 그렇다면 번역서에서는 원서에 없는 '화씨로'를 일찌감치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다. 미국에 살면서도 마인드는 한국이라. 쩝.
어쨌든 쨍쨍, 쩍쩍, 메마르게 타들어가는 날씨.
오후가 되니, 공기가 'gauzy'하단다. 아주 두껍단다(so thick).
그래서 공기 속을 움직여가는 내 몸뚱이를 다 느낀단다.
하...어떤 느낌인지 빡, 감이 온다.
이러니 대단하다 하는 거겠지.
그런데 번역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늦은 오후의 공기는 투명하고 가볍고 아주 얇아서 마치 그 속을 움직여 다니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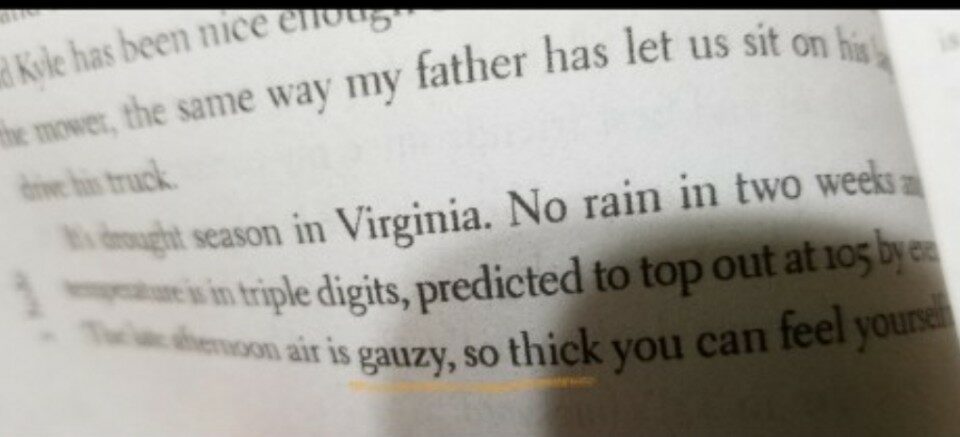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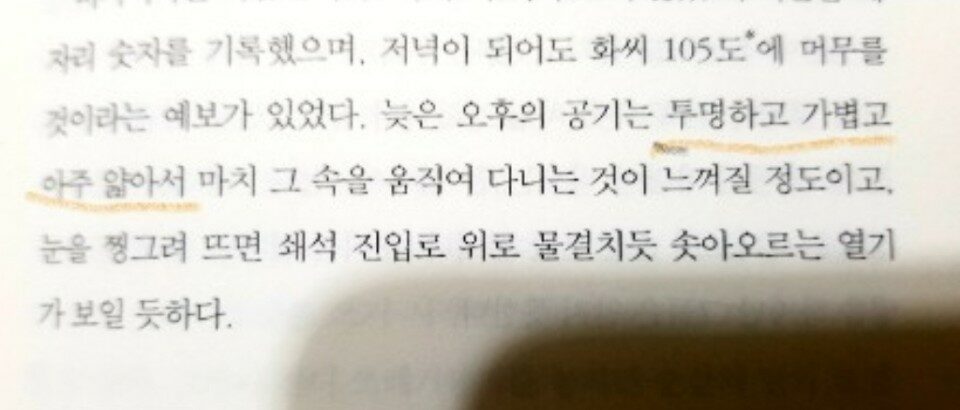
뭐지? 왜 완전 반대지?
'so thick'가 어떤 연고로 '투명하고 가볍고 아주 얇아져' 버린 거지??
다 떠나서...공기가 투명하고 가볍고 얇으면 내가 공기 속을 움직여 다니는 것이 느껴지나???
절대 아니지 않나? 공기가 투명하고 가볍고 얇으면 내 몸은 조절력을 잃고 막 떠다니지 않을까? 막, 갸우뚱하게 된다. 앤드류 포터처럼 깔끔한 작가가 이리 독자를 갸우뚱하게 만들 것 같진 않다.
그 '연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thick'이 느닷없이 'thin'으로 교체된 이유를.
아하, 앞에 있는 'gauzy'란 형용사 때문이구나.
사전에 보면 이리 되어 있다. '거즈처럼 얇고 투명한'
뭐..좋다. 이 뜻에 충실하기로 했다면. 사실, 영영사전을 봐도 그렇다.
[resembling gauze; thin and translucent]
그렇다면 번역자는 고민을 했으리라.
gauzy, so thick
대치되는 두 단어가 'air'를 하나로 수식하고 있으니.
그래서 'thick'를 버렸다. 단, 추측이다.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thick'이 실종된 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
'thick'가 실종되면서 졸지에 '공기'는 두꺼우려다 얇아져 버렸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표현과 '반목'한다.
화씨 105도, 즉 섭씨로 40도를 치솟은 열기 속에서 얇아지고 투명해지는 공기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공기가 투명하고 얇아질 때는 청명한 봄이나 가을, 아닌가? 여름은 공기가 무거워지고 가라앉아 우리의 숨통을 내리눌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철, 아닌가?
'gauzy'는 또 다른 뜻이 있다. '얇고 투명하다'는 1번 뜻 외에도.
Marriam Webster 사전의 뜻이지만 아무 영영사전에 다 있다.
2: marked by vagueness, elusiveness, or fuzziness
이 '2번뜻'에 따르면 'gauzy'는 뭔가 분명치 않고, 아른아른한...
즉 '뿌옇다'는 이미지에 가깝다.
생각하면 '거즈'가 그렇다. 얇지만 그닥 투명하지는 않다.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시야를 가리는 무언가가 있다.
'see through'하지는 않는 물질이란 소리다.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다행히, 'gauzy, so thick'은 '반목하지 않는' 수식어다.
'gauzy'하고 'thick'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뿌옇고 두꺼운 것으로...
모호하고, 뿌옇고, 두껍고, 두터운 공기 속에서 움직이려 하면
내 움직임이 조밀하게 느껴진다.
얇고 투명한 공기 속에서는 '남'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한편,
두껍고 뿌연 공기 속에서는 '나'의 움직임이 지각된다.
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긴 이야기 낭비일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된 번역이라면...
독자로서, 받을 걸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해, 손해 보는 거라고.
독자는 저자가 창조한 글의 감상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독자는 저자가 그 저자만의 손끝에서 첨예하게 직조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보는 낙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설사, 그런 독자가 70억 중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추신/이 책의 제목이 [The Theory Of Light and Matter]. 즉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다. 물론,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이 책 속의 또 다른 단편 제목이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 '빛'과 '물질'의 어떤 속성에 민감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저자가 솎아내고, 저자가 천착한 '빛'과 '물질'의 이론을 알고 싶다. 이왕이면 정확히. 거꾸로, 말고. '공기'는 '빛'이요,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