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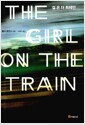
-
걸 온 더 트레인
폴라 호킨스 지음, 이영아 옮김 / 북폴리오 / 2015년 8월
평점 : 
절판

One for sorrow, two for joy, three for a girl... Three for a girl. I'm stuck on three, I just can't get any further. My head is thick with sounds, my mouth thick with blood. Three for a girl. I can hear the magpies-they're laughing mocking me, a raucous cackling. A bidding. Bad tidings. I can see them now, back against the sun Not the birds, something else. Someone's coming. Someone is speaking to me. Now look. Now look what you made me do.-이 책의 여는 글.
스릴러의 기본에 충직한 이야기, 히치콕의 가스등을 떠올리게 하는 플롯, 판단을 밀고 나가거나 망설이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간단하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를 저자 폴라 호킨스는 그의 첫 작품에서 영리하게 섞는다. 그 손놀림이 능란해서 마치 작은 도시의 카지노에 온 기분이다. 창밖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한가지가 명확해진다. 확신이 아니라 실수에의, 불확실성에의 가능성. 확신은 쉽다. 내 머릿속의 잣대로 명제를 가늠하는 일. 어려운 것은 불확실함에의 인식이다. 옳고 그름, 관계의 정직성 내지는 부정직,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전직 저널리스트였다는 폴라 호킨스의 소설 '걸 온 더 트레인'은 스릴러의 외피를 둘러쓴 감정의 곡선을 보여준다.
2013년 7월 5일
기찻길 옆에 옷 뭉치 하나가 버려져 있다. 셔츠처럼 보이는 연한 파란색 천이 더러운 흰색 옷과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다. 아마도 철둑의 작은 덤불숲에 불법으로 버려진 화물에서 빠져나온 쓰레기겠지, 아니면 이 구역 선로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것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이곳을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어쩌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고. 어머니는 내가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톰도 그렇게 말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더러운 티셔츠나 신발 한 짝이 버려져 있는 걸 보면, 나머지 한 짝과 그 신발들에 꼭 맞는 발밖에 생각나지 않는 걸 어쩌란 말인가.
기차가 갑자기 덜커덩, 끼익 하고 새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작은 옷 뭉치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기차는 힘차게 조깅하는 속도로 런던을 향해 달려간다. 내 뒷자레어 앉은 사람이 짜증 섞인 한숨을 힘없이 뱉는다. 아무리 기차 통근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도 애시버리에서 유스턴까지 가는 오전 8시 4분 완행열차는 견뎌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원래대로라면 45분 걸리는 구간이지만 제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드물다.-레이첼
걸 온 더 트레인, 이 책의 창문은 바로 레이첼이다. 소설의 문을 여는 것은 레이첼, 2013년 7월 5일 금요일, 그리고 기차 안의 사람들이다. 경쾌한 전화벨 소리, 기찻길 옆에 버려진 옷 뭉치를 보고 공상을 하는 레이첼, 기찻길 옆의 집을 보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하는 그의 머릿속이 바로 독자가 접하는 첫번째 창문이다. 책장을 넘기면 조금씩 드러나는 몇가지 필터. 그가 직업을 잃었지만 계속해서 런던으로 통근하는 척한다는 것, 톰은 그의 전남편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임, 알콜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레이첼은 아직도 알콜 의존이 심각한 수준이며 술을 마시면 자주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 것. 간단하다. 신뢰할 수 없는 화자.
남편과 이혼했는데도 아직 결혼 전 성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은 여자, 술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마시는 여자, 전남편과 지금 그의 부인이 사는 집을 찾아가기까지 하는 여자, 실직했음에도 아침이면 런던으로 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 그의 상황을 관통하는 화살은 중독일까 의존일까, 나는 판단을 망설였었다. 중독의 어원은 addicene. 양도, 굴복을 뜻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권리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내어주는 것.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되는 것. 중독 관련 질문지를 접하면 한 가지 반복되는 형용사, 부사가 있다. '과도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 동사와 명사를 넘치게 하는, 그 자체로 압도하는 단어.
과도하게 화내는가? 과도하게 필요로 하는가? 바로 '과도하게'. 레이첼은 과도하게 술을 마신다. 과도하게 거짓말을 한다. 전남편 톰과 그의 부인인 안나는 그런 레이첼 때문에 과도하게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그러던 와중 이 책의 다른 화자, 메건이 실종된다.
메건은 제스. 레이첼이 매일 기차로 통근하며 하루에 두 번 지나치는 어떤 집에 사는 여자이다. 통근길에 지나가는 집을 보며 레이첼은 그 집에 사는 부부를 보고 상상한다. 아마도 남자의 이름은 제이슨, 여자의 이름은 제스일 것이다. 그 상상이 너무나도 강력한 토대를 지녀서, 심지어 레이첼은 경찰에게 그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제스는 아마도..'라고 상상의 그 이름을 언급하기까지 한다. 레이첼은 그런 사람이다. 기찻길에 버려진 신 한 짝을 보면 그 신에 꼭 맞던 발을 상상하는 사람. 걸 온 더 트레인이 나아가는 방향은 독자가 가졌던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앞서 말했던 감정의 곡선을 만질 수 있다. 알콜 중독, 폭력, 거짓말, 신의, 믿음, 사실, 몸과 마음이 다칠 때 느끼는 절망,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관계에 만약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있다면,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란 무엇일까. 이 답은 비교적 쉬웠다. 덧셈과 뺄셈의 명확한 공식. 혹은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것일 것 같았다. 도약, 혹은 정확성. 내가 나일 수 있게 하는 관계. 한마디로 주도성을 잃지 않는 관계. 그러나 그것을 언제 알아챌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생겨나자 답하기가 어려웠다. 당장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나일 수 있게 해주는 관계라고 생각했건만 돌이켜 보면 아닐 때가 있었다. 이 사람과 있을 때의 나는 이카로스 같다고, 비약 없이 도약하고 햇빛도 머지않다고 생각했으나 바닷물에 풍덩 나자빠질 때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었다. 그 실패가 도리어 나를 계속 걷게 만들 때도 있었으니, 이것은 주정뱅이의 마지막 한 잔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끝이 없을지니.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무력감보다는 몸과 마음이 다칠 때의 절망이 더 클 때가 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어디서 상처를 입었는지조차 모르는 레이첼을 보며 독자는 그의 기억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다. 이 스토리 텔러는 어쩌면 마지막에 최후의 진실을 토로하는 최후의 일인이 아닐까? 아니면 모든 것은 술로 만든 강물 아래에 있고, 레이첼은 단지 거짓을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인 아닐까? 이 두 가지 상반된 시선 속에서, 조금씩 메건이, 안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I can hear the train coming : I know its rhythem by heart. It picks up speed as it accelerates out of Northcote station and then, after rattling round the bend, it starts to slow down, from a rattle to a rumble, and then sometimes a screech of brakes as it stops at the signal a couple hundred yards from the house. My coffee is cold on the table, but I'm too deliciously warm and lazy to bother getting up to make myself another cup.-Megan.
빛나던 소녀, 도망자, 아내, 화랑 딜러, 외도, 다시, 어디론가. 그리고 그사이 어딘가 있는 메건. 레이첼이 스스로 투영시켜 상상하던 제스는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레이첼이 상상하던 커피를 마시고, 레이첼이 상상하던 제이슨과 조용히 포옹한다. 실제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폭풍의 세기가 오히려 남들을 화나게 한다면 메건에게는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폴라 호킨스는 천천히 주저함 없이 메건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다.
창밖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는 마세요. 어떤 구름 뒤에 해가 있는지, 혹은 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메건이 실종되고 레이첼이 경찰에 증언할 때, 바로 그 구름이 문제가 된다. 신뢰할 수 없는 화자, 레이첼의 증언은 믿기가 힘들다. 메건이 실종되던 날 레이첼이 맨정신이었다 해도 믿기 힘들었겠지만 그의 모든 상황은 그의 모든 증언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일 년 전,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와 자기 집 정원에서 포옹을 하던 메건을 믿을 것인가? 전 부인 레이첼이 했던 것 처럼 남편 톰의 가방을 뒤지고, 컴퓨터 비번을 알아내서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찾는 안나를 믿을 것인가? 전남편과 그의 부인을 스토킹하며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메건 실종사건의 수사에 끼어드는 레이첼을 믿을 것인가?
이 물음표 속에서조차 확신은 쉽고도 힘든 것, 마음속 잣대가 분명하다면 쉬울 것이고 상황의 개별성을 인지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게으른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앞에서 레이첼, 안나, 메건은 각자 숨 쉬는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
I feel very cold. Did I know then that he wanted her? Megan was blond and beautiful-she was like me. So yes, I probably knew that he wanted her, just like I know when I walk down the street that there are married men with their wives at their sides and their children in their arms who look at me and think about it. So perhaps I did know. I wanted her, he took her. But not this. He couldn't do this.
Not Tom. A lover, husband twice over. A father A good father, an uncomplaining provider.
"You love him," I remind her. "You still love him, don't you?"
_Anna
메건은 점점 불행해지고 안나는 혼란스러워한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젠 남자들이 탐내기는커녕 좋아하기 힘든 여자가 되어버렸다. 단순히 살이 쪄서, 혹은 음주와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부어서만은 아니다. 내가 잠자코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 같다.' 레이첼의 이 말을 들을 때면 독자의 혼란은 더 강해진다. 자신의 존재, 혹은 마음에 비쳐 가장 닮은 듯한 어떤 캐릭터를 택하여 그 캐릭터에 이입하려는 독자의 성향을 폴라 호킨스는 십분 활용한다. 술 취한 채 어떤 소리를 층계 위에서 들었는데, 어쩌면 그 소리가 살인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가장 강력히 어필하는 스릴러 영화의 믿을 수 없는 주인공 같은 레이첼. 독자는 단지 무언가 위험한 일이 레이첼이 본 창문 뒤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챌 뿐, 그것이 진짜 위험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름을 알고 있다. 알아채기는 했지만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이 상황. 추리와 스릴러는 이렇게 속삭인다.
심연을 담았으되 닮지는 않은, 스릴러 이전에 사람의 마음 속 열 길 우물을 담은 소설.
She's buried beneath a silver birch tree, down towards the old train tracks, her grave marked with cairn. Not more than a little pile of stones, really. I didn't want to draw attention to her resting place, but I couldn't leave her without remembrance. She'll sleep peacefully there, no one to disturb her, no sounds but birdsong and the rumble of passing trains. -이 책의 여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