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리뷰를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간 책 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괜히 생각이 나는 작품이 있다. 읽을 때도 좋았지만 좀 지나고서도 여전히 좋은 책, 읽을 때는 크게 좋은 줄 몰랐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 더 좋아지는 책. 그런 책 위주로 몇 권 소개해 본다.

조르주 페렉, <임금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접근하는 기술과 방법>
이
기묘하고도 긴 제목의 작품은 읽을 땐 뭐야? 싶었는데 두고두고 곱씹게 된다. 제목도 그렇지만 형식은 더 특이하다. 이 작품은
100페이지를 조금 넘는 분량인데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직접 펼쳐보면 알리라. 조르주
페렉은 실험적인 글쓰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실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이뤄진
만큼 줄거리는 단순하다. 쥐꼬리만 한 봉급을 받는 대기업 말단 사원이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자 과장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과장을 찾아가 약속을 잡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장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과장이 건강 혹은 집안 문제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때에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가 괜히
불벼락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이 말단 사원은 그래서 과연 임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의 이
지지부진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종종 어이없는 상황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책을 덮을 때쯤에는 씁쓸함과 자괴감, 슬픔
등의 감정이 솟구친다. 고작 임금 인상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이토록 수많은 난관을 만나야 하는 말단 사원의 모습을 통해
‘회사’라는 공간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말단 사원의 우스꽝스러운 임금 인상 요청기를 읽다 보면
불합리한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좀 서글퍼진다.

미하일 조센코, <감상소설>
미하일
조센코의 작품은 처음 접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약장수 말투라고 해야 하나. 조센코는 딱딱한 문어보다는 ‘구어’
위주로 글을 썼으며 작품 내내 ‘작가는~’ ‘독자는~’ 이런 식으로 마치 약장사나 변사가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옛날이야기를
읊어주듯 소설을 썼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금은 수다스럽고 장황하기도 하고 ‘작가’와 ‘독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작품에
대한 완벽한 몰입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상소설>은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이 소박하고도 꾸밈없는 작가의
말투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조센코가 서문에서 밝혔듯
<감상소설>은 ‘별로 잘나지 못한 작은 사람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품에는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고 딱히 큰 사건이 펼쳐지지도 않는다. 또한 조센코의 말처럼 ‘사라져가는 가련한 삶에 대한 것’이다. 그런 이들의
삶을 유머러스하면서도 풍자적으로 묘사한 <감상소설>은 192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우리 삶을
묘사한 듯 느껴진다. 단편 속 대부분 등장인물의 꿈은 현실의 우리 삶이 그러하듯 그 어느 것도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애잔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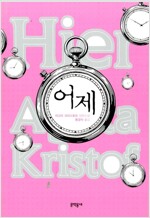
아고타 크리스토프, <어제>
아고타
크리스토프, 그녀의 작품은 ‘아프다’. 읽고 있으면 아프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가슴을 후벼 판다고 해야 할까. 이 투박한
언어로 쓰인 거칠고 짧은 소설은 그 어떤 미문의 긴 장편보다 여운이 길다. 왜일까?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도 그랬고
<어제>는 더 그렇다.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작품을 읽노라면 결국 소설이란 어쩌면 ‘언어의 놀음’ 혹은 ‘말장난’
보다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문학에서 ‘어떻게’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무엇을’이 더 중요하달까. 이 삭막하고 메마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쓴 듯한 투박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에는 고국을 떠나 망명자이자 노동자로 살아온 작가의 절절한 삶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다.’는 마지막 문장을 읽노라면 눈물이 뚝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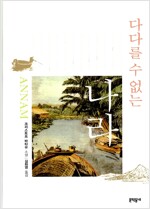
크리스토프 바타유, <다다를 수 없는 나라>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어제>가 ‘무엇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크리스토프 바타유의 <다다를 수 없는 나라>는
‘어떻게’에 더 중점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단순하고 건조한 문장의, 어떻게 보면 뻔하다 싶은
이야기(오리엔탈리즘도 느껴지고 종교적인 신앙의 냄새도 물씬 묻어나오는)를 ‘흠.. 글쎄...’하는 시선으로 삐딱하게 읽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읽고 나니 여운이 정말 길다. 한 번, 아니 두 세 번은 더 읽어보고 싶어졌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그 여백의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다다를 수 없는 나라>는 베트남에 선교를 간 성직자들의
이야기다. 작품 속에는 처음엔 베트남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왕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이 모든 게 사라진다.
시간도 공간도 사람도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고요함’만이 남는다. <다다를 수 없는 나라>를 읽으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 공간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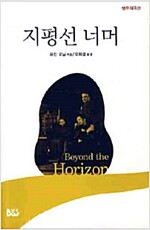
유진 오닐, <지평선 너머>
유진
오닐의 희곡이 보통 그렇듯 <지평선 너머>에도 한 가족이 나온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그 곁의 다정하지만 유약한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두 아들은 기질상 서로 굉장히 다르다. 큰 아들은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일꾼’
스타일로 건강하고 굳세고, 단순하며 현실적이다. 반면 둘째 아들은 현실적인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몽상가로 책 속의 삶,
‘지평선 너머’의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 두 아들 사이에 한 여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
형제의 삶, 더 나아가 가족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지평선 너머>는 유진 오닐의 다른 희곡들처럼 역시 쓸쓸하고
허망하다.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인생이란 ‘지평선 너머’ 무언가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삶이지만,
사실 지평선 너머에도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차라리 그 지평선 너머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순간이 차라리 더 행복한 삶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