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제목이 없어서 그냥 '헌팅턴과 미국의 정체성 위기'라고 붙였다(이때의 정체성은 당연히 '국가 정체성'을 말한다). 실상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김영사, 2004)의 한 문단 읽기이고, 재미있는 한 오역에 대한 지적이다. 마침 9.11과 관련된 내용이라 '시의성'은 있는 듯해서 적어둔다.

헌팅턴의 책은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란 원제와 (직역하면)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들(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이란 부제(국역본에는 '미국의 정체성 위기'라고 돼 있다)에 충실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그의 지적대로, 이 정체성 위기가 세계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비단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독자라 하더라도 참조할 만하다. 내가 읽을 대목은 '국가정체성의 위기'란 1장의 한 문단인데, 이렇게 시작한다.
"세상에 영원한 사회는 없다.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다. "스파르타와 로마가 명망했는데, 어떤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겠는가?" 가장 성공한 사회들조차도 언젠가는 내부 분열과 해체의 위협에, 그리고 더 격렬하고 무자비한 외부의 야만적 힘에 노출된다. 결국에는 미국도 스파르타와 로마, 그밖의 인간 공동체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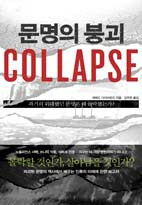
여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제국의 종말'론을 따른다(더 나가면 '문명의 붕괴'가 되겠다). 헌팅턴의 입장은 그래도 그러한 '자연적인' 종말을 좀 지연시켜보자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체성 실체는 인종, 민족, 언어와 종교로 대변되는 문화, 그리고 이념이 규정했다. 그중에서 인종과 민족에 의한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에 의한 미국은 위협을 받고 있다. 소련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이념은 공동체의 인종, 민족, 문화의 원천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로버트 캐플런이 주장했듯이, 일부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헌틴턴이 국가정체성의 구성소로 카운트하고 있는 것은 (1)인종(race), (2)민족(ethnicity), (3)문화(culture), (4)이념(ideology), 네 가지이다(문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소는 언어와 종교이다). 이 중 미국의 경우에 인종,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만큼 인종과 민족은 더이상 미국의 국가정체성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겠다), '미국식' 문화라는 것도 쇠잔해간다는 것. 그렇다면 남는 건 이념, 곧 이데올로기뿐인데. 이건 소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한' 구성소가 못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가정체성이라는 게 아주 취약하다는 얘기이다. 인용문의 '로버트 캐플런'은 최근에도 <제국의 최전선>(갈라파고스, 2007)이 우리에게 소개된 '로버트 카플란'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부 사회는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때 국가정체성, 국가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문화 가치를 갱신해 붕괴와 해체를 연기시키고 중단시킬 수 있다. 미국인들은 9.11사태 후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다가올 3001년에도 그들이 마찬가지로 직면한 도전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국가와 공동의 정체성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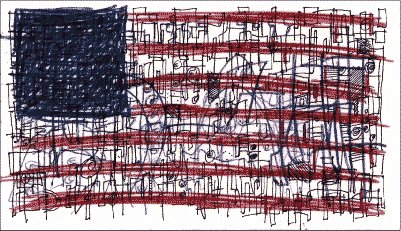
이 대목은 오역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문을 같이 인용한다(예전과 달리 영문 인용이 깨져보이는 건 유감스럽다). "Yet some societies, confronted with serious challenges to their existence, are also able to postpone their demise and halt disintegration, by renewing their sense of national identity, their national purpose, and the cultural values they have in common. Americans did this after September 11. The challenge they face in the first years of the third millennium is whether they can continue to do this if they are not under attack."(12쪽)
'재미있는 오역'이라고 한 건 맨마지막 문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다가올 3001년에도 그들이 마찬가지로 직면한 도전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국가와 공동의 정체성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옮겼는데, 뜸금없이 '3001년'이 왜 나오는가?(현실정치를 다루는 정치학자가 천년 후의 일을 왜 걱정하겠는가?) 역자가 좀 무신경하게 옮긴 경우인데, 'third millennium', 곧 '세번째 밀레니엄'은 300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이다. 그리고 'the first years'를 '3001년'이라고 해놓았는데 전문번역가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다(하청을 주었다면 몰라도).
다시 옮기면, "2000년대 초반에 그들이 당면한 도전은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러한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건 쇠퇴해가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과정을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게 헌팅턴의 생각이다. 그리고 9.11이라는 국가적 도전에 직면해서 미국사회는 일시적으로나마 '단합'함으로써 확고한 국가정체성("우리는 미국인이다!")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그러한 '단합'을 어떻게 상시화하느냐이다. 즉, 외부로부터 공격받거나, 9.11과 같은 비상시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 그러한 문제의식(위기진단)과 나름의 해법제시가 책의 골자이다.
물론 그 이면은 국가적 단합을 '상시화'하기 위해서 차선의 방책으로 계속적인 외부의 공격과 위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어찌해보겠다는 거야 누가 말리겠는가...
07.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