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쉬의 <심리학 나 좀 구해줘>(갤리온, 2013)은 그렇고 그런 책 정도로 넘기려고 했다. 제목이 좀 호들갑스럽고, 그런 호들갑스런 포장이 보통은 빈약한 내용을 감추고 있기 마련이라는 '경험칙' 때문이다.



한데 대범하지 못하게도 "이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이 책에 들어 있는 심리 법칙으로 무장한 상대방이 당신을 골탕 먹여도 언짢아하지 마라"는 경고 문구에 넘어가 몇 페이지 읽게 됐다. '적들이 읽는 책'에 대한 관심이랄까. 흠, 의외로 읽을 게 있어서 놀랐다.

어쩌면 '사이코테인먼트'를 추구한다는 이 독일의 심리학 엔터테이너들이 굉장히 영리한지도 모르겠다(심리학계의 '컬투'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듀오다. 이 책을 포함해 합작한 책이 국내에 네 권 소개돼 있다). 그들의 자부는 이렇다.
딱딱하고 어려운 심리학 책은 많지만 지금 당장 내가 맞딱뜨린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일러주는 심리학 책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집적 쓰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 그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4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쓰고 수정을 반복해 가며 완성한 책이 <심리학 나 좀 구해줘>다. 결과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고민하든 심리학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 수 있는 진실이다.
이 자신감이 이 책의 최대 강점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1가지 심리법칙'이란 부제는 이 자신감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허세는 아니다. 상당수가 실험적으로 입증된 보고들이어서다(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는 면이 많은 건 우연히 아니다). 내놓고 읽기에는 멋쩍지만, 읽고 나면 '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란 물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답할 수 있을 듯하다. 당신만 모르는 심리법칙 51가지? 이런 건 안 읽는 척하면서도 필독하도록 하자.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보란 듯이 버려도 좋겠다(중고로 내다팔거나). '적들이 읽는 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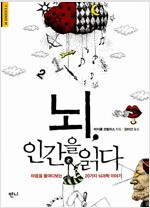


마이클 코벌리스의 <뇌, 인간을 읽다>(반니, 2013)도 마찬가지로 적들이 읽을까 염려되는 책이다. 이유는? 뇌과학에 관한 가장 얇은 책이어서다. 부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20가지 뇌과학 이야기'. "무척 재미있고 정보가 가득하다"는 평대로 분량 대비 정보 집적도가 매우 높은 책. 그렇다고 정보 짜깁기형도 아니다. 저자는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자로 특히 사람이 어떻게 회전하는 물체를 인지하는지, 또 언어가 어떻게 손짓에서부터 진화했는지를 연구한다고.

찰스 파스테르나크 편저의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말글빛냄, 2013)에서는 '기억, 시간, 언어' 장을 집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작은 <반복하는 마음: 인간의 언어, 사고, 문명의 기원>(2012)인데, 사실 <뇌, 인간을 읽다>(원제는 <마음의 조각>)보다 더 관심이 가는 책이다.
여하튼 <심리학 나 좀 구해줘>나 <뇌, 인간을 읽다>처럼 허름해(?) 보이는 책이 쏠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 긴장하게 된다. 적의 수중에 넘어갈까봐? 이런 심리는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더 들춰봐야겠다...
13.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