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검은 비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보인다. 보더 정확하게는 물감통에서 번져가는 듯한 짙은 회색 비구름이다. 오늘부터 장마비가 내린다더니 예고대로 빗줄기가 굵다. 방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날씨다. 오늘 아침 '책읽는 경향'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반 부닌의 단편집 <어두운 가로수 길>(지만지, 2008)이다. 대부분은 예전에 <비밀의 나무>(삶과꿈, 2005)에 실렸던 작품들인데, 러시아어판 제목도 <어두운 가로수 길>이다(원저는 두툼한 단편집이다). '어두운 분위기'가 어쩐지 연관성이 없지도 않을 듯싶어서 기사를 스크랩해놓는다. 20세기 문학 강의 때 읽을 작품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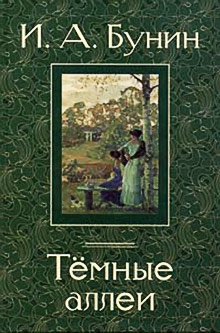
경향신문(09. 06. 29) [책읽는경향]어두운 가로수 길
언젠가 이반 알렉세예비치 부닌의 단편집이 내 방 책꽂이에는 물론 집안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살짝 맥이 풀려버렸다. 조카 녀석이 빌려가서는 학교에서 돌려 읽다가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여중생이 읽기엔 좀 그런데’ 하고만 말 수가 없어, 나는 책을 내준 아내에게 채신없이 화를 내고 말았다. 나는 부닌의 단편들을 늘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다.



‘깨끗한 월요일’을 시작으로 부닌의 단편집 <어두운 가로수 길>(김경태 옮김·지만지)을 오랜만에 다시 읽었다. “신께서 당신 편지에 답하지 않을 힘을 주시길 바라요”라는 문장은 역시 좋았다. 좋아서 두 번을 읽었다. “시간에 대한 희망을 제외하고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대목도 여전히 곱씹을 만했다. 한데 이 매혹으로 가득 찬 사랑이야기들이 주는 느낌이 이전과는 제법 달라져 있었다. 그게 어젯밤의 술 때문인지, 오늘 아침 바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혹 감정의 깊이가 소멸의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은 아닐지.

부닌은 표제작에서 말했다. “모든 게 사라진다고 잊히지는 않아요”라고. 내게는 이 한 줄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사라짐과 잊힘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걸까? 죽은 자도 기억과 추억이며 회한은 남기게 마련이란 뜻이겠지. 그래도 문장은 수정될 수 있겠다 싶었다. 결국엔 잊히고 말 테니까, 그런 거니까. 하지만 이 한 줄은 부닌의 단편들 모두에 대해 결론적이고, 그러므로 결정적이다. 지독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울 만큼 지독한 상실을 그려낸 사례로 부닌의 단편들을 지목한다.(현진현 소설가)
09. 06. 29.
P.S. 비는 잠깐 오다가 다시 해가 났다. '어두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다. 이것이 '장마'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