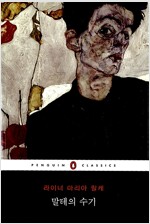릴케의 <말테의 수기>(1910)를 여름학기 강의에서 읽을 예정이다(강의에서 다루는 건 처음이다). 기억에는 두번쯤 읽은 책인데, 내가 읽은 번역본은 현재 절판된 상태다(독문학자 강두식, 전영애 교수의 번역본들이었다). 좋아하는 작품이라 세계문학전집판으로 새 번역본이 나올 때마다 구해놓기도 했다. 강의에서 막상 다루려니 어떤 번역본을 골라야 할지 고심이 된다. 선택지는 민음사판, 펭귄클래식판, 열린책들판이다(알라딘의 판매량순이다).
독일문학 강의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강의가 거의 마무리다. 토마스 만과 헤세를 반복해서 읽었고(카프카를 포함하여) 여름에는 브레히트와 하인리히 뵐, 권터 그라스, 그리고 제발트까지 (다시) 읽을 계획이다. 나대로는 10월중에(16-25일) 진행할 독일문학기행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말테의 수기>도 마찬가지인데(파리로 가야 했겠지만) 릴케의 자취를 일부 따라가보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그의 시들과 함께 다시 읽어보려는 것이다. 일종의 기분 조율이랄까.
강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제는 영어본도 주문하면서 준비 모드로 들어갔다. 책을 읽는 것과 강의에서 다루는 건 별개여서 이 작품을 둘러싼 여러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작품의 구성과 주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나의 ‘청춘의 책‘ 가운데 하나인 <말테의 수기>를 그런 필요에 따라 다시 읽으려니 묘한 흥분도 느끼게 된다. 언젠가 파리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릴케의 파리‘ 혹은 ‘말테 브릭게의 파리‘ 덕분이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인 릴케가 단 한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이름이 <말테의 수기>와 함께 기억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20대의 나‘가 내게 귀띔해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