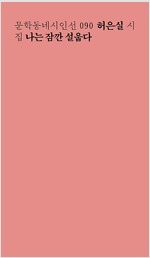일요일 저녁이면 이주의 강의책과 강의자료를 식탁과 식탁 주변에 모아놓는다. 오래된 습관은 아니고 아마도 한두 달 된 듯싶다. 미리 챙겨놓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생기면서 취하게 된 대응조처다.
오늘도 행방이 묘연한 책은 다시 주문하고 엊그제 배송받은 책은 또 주문할 수가 없어서(그새 행방이 묘연하다니!) 계속 추적중이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가 지명수배중인 책이다(원서와 같이 도주중이다).
책을 찾느라 책들을 뒤집어놓다가 허은실의 <나는 잠깐 설웁다>(문학동네)를 발견하고 펴들었다. 잠깐 보다가 만 듯한데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아서 기억엔 ‘밋밋한 시집‘으로 분류돼 있다. 잘못 본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뒤로 몇편 훑어보았지만 뭔가 통하는 시와 만나지 못했다. 여성독자라면 ‘우리들의 자세‘나 ‘입덧‘ 같은 시에 공감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 하지만 다른 시들은 읽기 괴로웠다.
늙은 구름은 칭얼대고
죽은 아기들은 웃어대고
버스는 좁은 벼랑 위를 달린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치사량이 언제나 치명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빚 받으러 온 사내들처럼 목 조르는
쉰밥이여
무엇을 주리 빈 젖을 주리
‘지독‘이란 시의 첫 세 연인데, 일단 여기까지 읽는 것도 괴롭다. ‘늙은 구름‘이나 ‘죽은 아기들‘을 들먹이는 시 치고 괜찮은 시를 보지 못했다. 좋지 않은 시의 견본으로나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 두 연도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다.
악한 게 아니라 다만 약한
그리하여 독에 이르는
전갈과 뱀과 당신과 우리
지독해진다는 것
매독처럼 피어
서로에게 중독되는
허기의 무궁
비 내린 숲의
비린 냄새를 따라가면
독버섯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마지막 연만 봐줄 만하다. ˝매독처럼 피어/ 서로에게 중독되는/ 허기의 무궁˝ 같은 구절은 습작에서나 허용되는 거 아닌가.
‘라이터소녀와 껌소년의 계절‘이란 제목의 시도 제목부터 관념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들 너무 따듯해서
이 거리의 사랑은
일회용 라이터처럼 흔해요
라이터 하나에 가든과 라이터 하나에 모텔과
라이터 하나에 오빠 오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대를 접게 된다. 데뷔 시집의 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한데 습작티를 못 벗은 시들은 버렸어야 하지 않을까.
‘Midnight in Seoul‘도 마찬가지.
도시의 틈새에서
어둠이 새어나온다
홍등이 걸린다
모텔 네온사인이 켜지고
묘지에 돋는 붉은 십자가들
라디오에선
이퓨렛미인 유네버로스트미
내부순환로 양방향정체
방음벽 너머로 골리앗 크레인
도시를 굽어본다
피가 튄 곳마다 거인들이
태어난다고 하지
저 환한 통증들 좀 봐
관념적인 묘사로 공감이나 발견을 끄집어내기는 어럽다. 서울에 대한 묘사가 이럴진대 ‘월 스트리트‘는 어떻게 묘사할까.
온다
지축을 흔드는
강철 페니스
시든 정자들 쏟아진다
계단을 오르는
검은 정장 행렬
마천루로 들어간다
이런 시를 계속 나열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다시 <시녀 이야기>나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