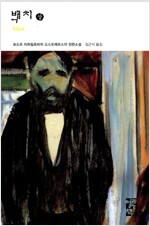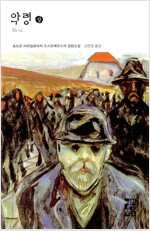도..키의 <죄와 벌>이 던지는 치명적인 물음 중 하나가 이것이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라스-프가 직접 소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하겠는가, 저 노파처럼 '못된' 자가 살아야 하겠는가, 마르-프 가족처럼 아무 죄없는 자가 살아야 하겠는가 등. 어릴 때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이 물음, 이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간과한다. 즉, 노파는 과연 '못됐나'. 적어도, 도끼에 맞아죽어야 할 정도로 악인인가. 그 다음 소냐 가족들은 무조건 '선인'인가.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결함이나 악덕도 없는가.
노파 알료냐의 이기주의와 탐욕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녀는 직업 자체가 고리대금업이고(고로 '고리'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열심히 살고자 했던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리자베타를 학대한 것 역시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그녀의 장애 상태, 둘의 관계, 업무 분담, 노동 착취 등에 관해선 사실 별로 확인된 바가 없다.(참고로, 장애인 학대는 가족 사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지만, 이건 가깝기 때문,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라스-프가 소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류는 무조건 선인인가. 차라리 그들이야말로, 온갖 악덕의 집합체이다. 나태, 음주, 열패감, 히스테리, 광증, 허영심, 과거 집착 등.
여기서 우리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제목을 떠올리게 된다. '불쌍한 것들'. 레 미제라블. 좀 더 세련되게, 영어 버전으론 '푸어 크리쳐'. 어느 대목에서인가 유발 하라리가 쓴 대로, 그들은 악마도 천사도 아니었다, 그냥 인간이었다.



라스-프의 범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그가 죽인 노파가 (리자베타는 뜻밖의 오류였다고 해도) 절대악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야말로, 혹은 그녀 역시도 그저 불쌍한 존재,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누가 죽어야 하고 누가 살아야 하는가. 겸사겸사, 그 다음에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는, 노파 하나 죽인다고 과연 세계가 구원받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라스-프 이전에 그런 일이 행해졌을 터이다. 너만 똑똑하고('천재') 다른 놈들은 다 병신('이')인 줄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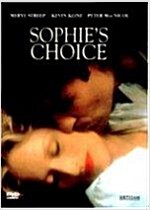
어릴 때 명화극장(?) 이런 데서 봤던 영화. <소피의 선택>. 여배우(메릴 스트립)가 좀 안 예쁘다고 생각하고 봤던 영화. 독일 나치, 무슨 소용소,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다. 언제 소설로 한 번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여태껏 못 읽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런 치명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랄 밖에.


그리하여, 노회한(!) 중년 작가 도-키는 그 대답을 신에게로 떠넘긴다. 이 점은 <안나 카레니나>의 제사에 드러난 톨-이의 은근한 비겁함(?)과 유사하다. 굳이 '비겁'하다고 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사회소설'(+가족소설)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그마저도 결국 궁극의 해답은 현실에서 찾지 못하는 것이다. <전.평.>에서는 그게 그리 불가능하지 않았을 텐데(작가도 아직 삼십대) <안나...>, <부활>에 이르면 속수무책. "복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도-키에게 이 말을 해주는 신의 사도, 천사는 소냐이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는 식. 사람이 나이 들 수록 종교로 가는 것이 요즘 정말 이해된다. 감성에서 지성에서(감성-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지난 여름에 읽고 수업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다들 웃었다, 문자 그대로 웃었다. <무진기행>의 작가의 개종이라, 거참. 이어령과 박완서의 저 책은 읽지 않았으나, 두 저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참척의 고통'이라던가. 박완서가 쓴 글을 통해 알게 된 표현인데, 자식 잃은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다. 늙은이와 젊은이, 부모와 자식. 이들 중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그나마, 여러 견지에서 봐도, 고민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다시금 이 '비의'는 무엇인지.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박완서 수필 어딘가에서 본 구절. "자식 먼저 보내고 밥을 처 먹는 어미의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서..."
*
의식을 찾고 퇴원하는 아이의 사진. 실루엣에서 이미 젊음이 느껴진다.(한데, 이런 사진, 이런 보도는 이제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널리즘의 저속에 대해서 또 한 번 분노하게 되는 순간이다.) 아이가 가진 그 젊음이 한편으론 왜 그리 슬퍼 보이냐. 또 다른 한편, 똑같은 시공간을 살았으되 이토록 엇갈리는 삶의 명암은 무엇이냐. '죄'는 있으나 '죄인'은 없는 상황.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상황이다. 아들(남자친구)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가족도 그렇고.
'감성'과 '지성'(이성)의 대립항 외에 도-키가 굳이 '영성'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래 전에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군이 지금의 그 인생 계속 살아보라, 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
다시금 실루엣. 실루엣만 봐도, 윤곽만 봐도 나이가 보인다. 유년,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아이의 성장 발달에서 만 6-7세가 되면 소위 '베이비몸매'를 졸업한다고 한다. 머리통이 몸통에서 보다 더 독립하고 가슴과 배의 윤곽이 형성되어 상체-몸매가 된다. 몸놀림이 날렵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아, 그래서 이 연령대가 학령기의 시작인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대략 만 10세쯤으로 잡는 듯하다. 적어도 피아제 이론은 그런 모양이다. 여기가 말하자면 인지 발달의 데드라인. 물론 전체 그림은 그 전에 완성되지만, 일종의 패자부활전, 연장전이랄까. 너무 암담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아이의 까마득한 미래와, 역시나 어딘가 꽉 막혀 도무지 뚫리지 않을 것 같은(연통?!) 나의 현재가 맞물려, 올 연말도 참 우울하다. 과연, 자리는 하나 밖에 없고,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할지. 아니면, 이렇게 다 죽어야할지. 모두가 다 죽는 저 비극이 오히려 희극일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