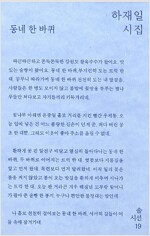오늘 읽기 2019.1.15.
《동네 한 바퀴》
하재일 글, 솔, 2016.9.11.
하루를 돌아보니 길다. 어제 고양에서 고흥까지 역사인문책 2500권 남짓 실어서 우리 책숲집에 부렸고, 새벽바람으로 일어나 밀린 글을 쓰지만 마감글을 아직 못 썼고, 밥짓고 우체국으로 동시집을 부치러 다녀오고, 다시 저녁을 지어서 차리니 눈은 외려 멀뚱멀뚱하며 몸이 묵직하다. 큰아이하고 동시집 스무 권을 부치러 읍내로 다녀오는 길에 《동네 한 바퀴》를 챙겨 읽었다. 뜻밖일는지 안 뜻밖일는지 모르나, 시가 따분했다. 시쓴이가 꽤 나이가 있은 탓인지 한자말을, 이 가운데 네 마디 한자말을 자주 쓴다. 젊은 시인은 한자말이든 네 마디 한자말이든 요새 잘 안 쓰고 영어를 쓴다. 쉽게 말해서, 젊거나 늙거나 한국에서 시인이란 사람은 한국말을 퍽이나 안 좋아한다. 늙었으면 한자말을, 젊었으면 영어를 좋아한다. 한국말을 좋아하는 시인을 만나기란 까마득하다. 어쩌면 누가 한국말을 좋아하며 시를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보스러울는지 모른다. 생각해 보라. 서울에 천만 넘는 사람이 그냥 산다. 시골이나 숲이 좋다며 살림터를 옮기는 이는 몇 없다. 글 문학 인문 교육 정치 어디에서나 스스로 조촐히 삶을 사랑하며 손으로 짓는 길을 가려는 벗님이나 이웃님도 몇 없겠지. 그러나 바란다. 숲살림을 노래할 시인을, 벗님을, 이웃님을. ㅅㄴㄹ
(숲노래/최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