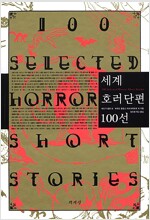
* 『헨트에서 생긴 일』 (The Thing at Ghent, 발표 연도 미상)
발자크의 단편 『헨트에서 생긴 일』은 발자크가 쓴 글 중 가장 짧다. 이 글이 공포 단편 선집에 포함된 것이 의아하다. 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작품 원제는 ‘The Thing at Ghent’, 역자는 원제를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소개했다. 헨트는 벨기에에 있는 공업 도시이며 ‘Ghent’는 영국명이다. 프랑스명은 ‘Gend’다. 그런데 발표연도를 ‘1900년’으로 표기했다. 발자크가 살아있었을 때 발표되지 못한 글이 작가 사후에 발견되어서 1900년에 발표되었던 것일까. 이 작품의 정체가 궁금해서 ‘The Thing at Ghent’로 구글을 검색해봤다. 위키피디아에 ‘The Thing at Ghent’ 관련 정보를 발견했다. 발표 연도는 없고, 그냥 ‘발자크가 쓴 공포소설’이라고만 짧게 소개했다. 책에 나오는 발표 연도는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잠정 결론으로 발표 연도를 ‘미상’으로 썼다. 그럴 일은 100% 없겠지만, 공포소설이라고 해서 이 작품을 찾아 읽지 않았으면 한다. 나 같으면 지루하더라도 발자크가 쓴 장편소설을 읽겠다. 내가 요약한 줄거리만 보면 짧은 소설을 다 읽은 셈이다.
헨트에 십 년간 미망인으로 지낸 노부인이 산다. 그녀는 불치병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른다. 노부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 명의 친척이 임종을 기다리는 그녀 곁을 지킨다. 그런데 세 명의 친척은 외롭게 사경을 헤매는 노부인이 가여워서 보살피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부인을 찾아온 것이다. 의사는 노부인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다. 친척들은 노부인의 임종 순간을 기다린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 숯덩이가 된 장작 하나가 갑자기 난로 밖으로 나와 마룻바닥에 떨어진다. 다 죽어가던 노부인은 마룻바닥에 떨어진 숯덩이를 보는 순간, 두 눈을 부릅뜨면서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침대에 내려와 마룻바닥에 있는 숯덩이를 집게로 집어 들어 다시 난로 안에 던진다. 친척들과 의사는 노부인을 부축하여 다시 침대로 눕힌다. 노부인은 숯덩이가 떨어진 마룻바닥을 주시한 채 숨을 거둔다. 친척들은 노부인의 기이한 행동이 마룻바닥 밑에 숨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암시라고 생각한다. 숯덩이가 떨어져서 그을린 흔적이 남은 마룻바닥을 파보게 되자, 거기에 여러 구의 사람 유골이 있었다. 유골 무더기 중 하나는 타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백작의 남편이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헨트에서 생긴 일』이 공포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야기 구성이 다소 어설프다. 결말에서 독자는 이야기에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유산이 탐난 부인이 남편을 죽인 후, 그가 타지에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꾸며 자신의 범죄 행각을 숨겼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백작의 자연사를 숨기려고 어쩔 수 없이 백작의 시체를 마룻바닥 밑에 보관하는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결말에서 이상한 점은 나머지 유골의 정체다. 애매한 결말은 부인과 유골과의 관계를 더 궁금하게 만든다. 진부한 설정이지만, 차라리 죽은 남편의 유골과 몰래 숨겨둔 재산 금고가 발견되는 결말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노부인이 죽기 일보 직전에 보여준 기이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로 안에 있던 장작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설정은 생뚱맞지만, 죽은 백작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한 영적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에 친척 중 한 사람이 마룻바닥에 떨어진 장작을 집게로 집었다면, 마룻바닥 밑에 있는 남편의 유골이 발각될 수 있었다. 그래서 노부인은 죽은 남편에 대한 비밀을 자신의 무덤 속에 안고 가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장작을 난로 안에 던진 것이다. 이야기가 너무 짧아서 아쉽다. 괴기스러운 상황이 긴장감 있게 연출되지 못한 채 결말이 바로 이어진다. 이렇다 보니 독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의 반전 효과를 확 살리지 못했다. 이야기의 분량을 좀 더 늘려서 고딕 소설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를 더 조성했더라면 결말이 한층 돋보일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