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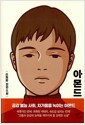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소설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다.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한다. 아주 어려서는 '아이가 아주 침착한 편이에요~'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평범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엄마는 윤재에게 늘 말했다. '튀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 아마도 엄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긋난 타인의 시선을 많이도 의식했던 것 같다. 덕분에 윤재는 '희노애락애오욕'이라는 일곱 가지 감정을 끊임없이 학습했다. 학습은 엄마와 할머니가 제시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윤재가 커갈수록, 그 상황이란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다양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엄마와 할머니마저 알 수 없는 괴한에게 사고를 당했다. 그래도 윤재는 괜찮았다. 윤재가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다.
늘 윤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던 두 사람이 사라졌지만, 윤재가 완전히 혼자였던 것은 아니다. 위층의 심 박사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곤이'도 늘 윤재 곁을 맴돌았다. 소설의 또 다른 축인 곤이는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다. 곤이는 늘 분노로 가득 차있었다.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은 서로를 궁금해하다, 친구가 된다. 그 과정에서 윤재도 곤이도 성장한다.
심 박사를 찾아간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폭격에 두 다리와 한쪽 귀를 잃은 소년이 울고 있다.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뉴스. 심 박사가 화면을 보고 있다. 얼굴은 무표정하다. 내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내 시선은 미소 띤 박사의 얼굴 뒤로 떠오른 소년에게 향해 있었다. 나 같은 천치도 안다.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 웃고 있느냐고. 누군가는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등지고 어떻게 당신은 웃을 수 있느냐고. (손원평, 아몬드, 209쪽)
심 박사가 유독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채널을 무심히 돌리던 엄마나 할머니도 그랬다. 윤재의 엄마는 언젠가,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다. 하지만 윤재에게 의문은 계속된다. 엄마와 할멈을 빤히 바라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은 눈앞에서 그 일을 목도했다. 멀리 있는 불행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리였다.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윤재를 부둥켜안은 곤이의 몸이 누군가의 발길질에 앞뒤로 흔들릴 때, 윤재는 퍼뜩 생각한다. 얼굴 위로 톡 하고 떨어진 눈물방울이 델만큼 뜨겁다고.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탁, 하고 터진다. 뭔가가 밀려들었다가 밀려 나간다. 느낀 것이다. 그것이 이름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외로움인지 아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지 환희였던지간에- 윤재는 곤이를 통해 무언가를 느낀 것이다. 모호했던 것들이 한순간 카메라의 포커스가 맞듯 뚜렷해졌다가 사라진다.
읽는 내내 어느 특별한 소년의 성장기라고 생각했다. 윤재가 제 엄마의 바람대로 '평범한 아이'가 되기를 바랐고, 곤이와도 화해 아닌 화해를 하기를 바랐지만- (고백하건대)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의 말미에서 들켜버리고 말았다. 마치 심 박사가 전쟁이라는 아픔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윤재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윤재를 저 멀리- 그러니까 소설 속의 아이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만, 느끼지 못한다. 가끔은 느끼는데 느끼지 못하는 척하고, 또 가끔은- 느끼지 못하는데도 느끼는 척한다. 너무 멀다는 이유로, 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돌아서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210쪽)"
하는 윤재의 문장을 읽으며 나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소설은, 윤재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또 '감정 불능'에 빠진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책방은 수천, 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구 밀도 높은 곳이다. 그러나 책들은 조용하다. 펼치기 전까진 죽어 있다가 펼치는 순간 이야기를 쏟아 낸다. 조곤조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손원평, 아몬드, 1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