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나이팅게일은 오십 대의 피아노 강사다. 그녀에게는 결국 배신당했지만 행복했던 추억을 남긴 사랑과 초콜라띠에였던 아버지의 따뜻한 부정의 기억이 남아 있다. 게다가 '그 학생'이 금요일만 되면 나타나 미스 나이팅게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소년은 남달랐다. 가르칠 것이 거의 없었다. 교습을 한다기보다는 어느새 그 아이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 아이를 만나는 날을 고대하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학생을 만난 것이다.
윌리엄 트레버의 마지막 작품들. <The Piano teacher's Pupil>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없다. 특별한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힘의 결 사이에는 내밀한 삶의 깨달음이 숨겨져 있다. 읽는 이는 그것을 꺼내어 자신의 이야기에 슬몃 끼워 넣게 된다.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나 읽는 자마다 저마다의 것으로 변주되어 해석된다. 그는 쓰는 일을 그렇게 사는 일과 한데 통합해 버렸다. 미스 나이팅게일의 신동 제자가 올 때마다 그녀 집의 소소한 물건들이 사라지는 이야기도 그렇다. 윌리엄 트레버는 그러한 삶의 불합리함과 모순이 언제나 포복해 있다 무언가 완전해질 것 같다는 환상의 순간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기막히게 포착했다. 어쩐지 너무 완벽하거나 지나치게 너그럽거나 완전한 사랑일 것 같은 순간, 기막히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반전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게 되는 순간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반전은 허구보다 실제에서 더 빈번한 것도 같다.
미스 나이팅게일은 그 아이를 완전히 용서해버린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무수히 일어나는 그 휘어지고 어긋난 이야기들의 거친 모서리를 응시할 뿐이다. 그녀의 인내와 그녀의 용인은 후에 보상을 받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의아해 할 때 시간은 불완전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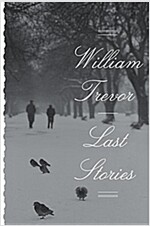
조금쯤 둔감해도 괜찮다. 필립 로스가 <죽어가는 짐승>에서 노년에서 둔감함이 관례라고 했던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아이는 떠났다 청년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다시 피아노를 연주한다. 미스 나이팅게일은 비로소 무언가를 이해하게 된다. 구체적이지는 않다. 윌리엄 트레버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나 보다. 결국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러고 보면 그런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