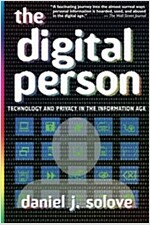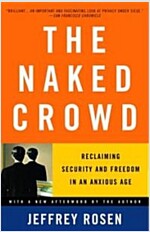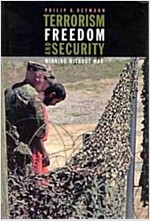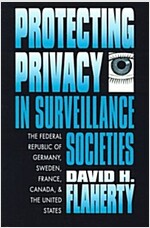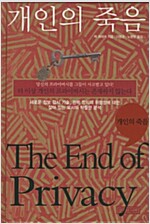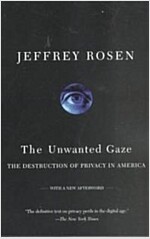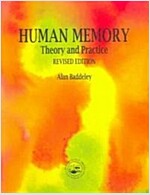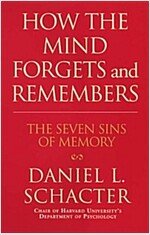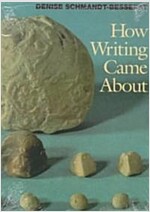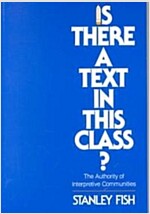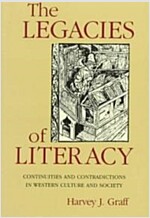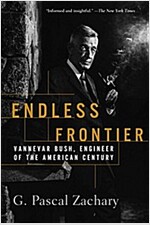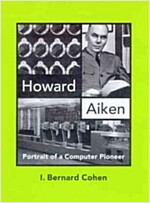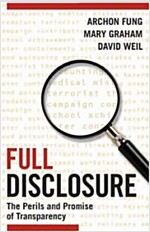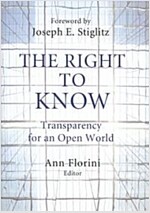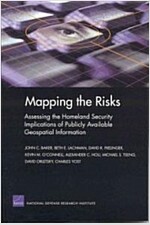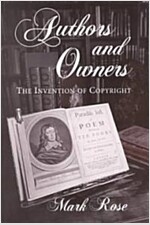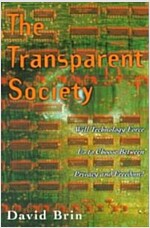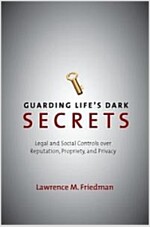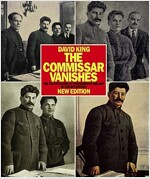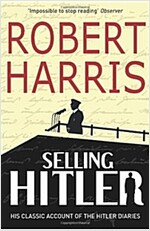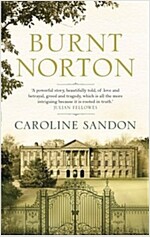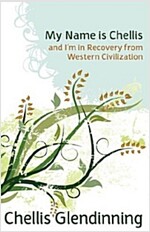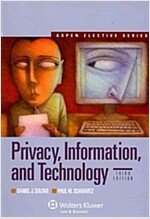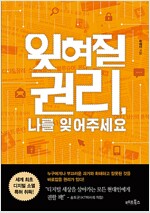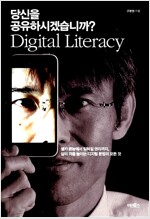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모두 미래의 시간 안에 현존할 것이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담겨 있다.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존한다면
모든 시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있을 수 있었던 일은 하나의 추상으로
사색의 세계에서만
하나의 영원한 가능성으로 남는 것이다.
있을 수 있었던 일과 있었던 일은
언제나 현존하는 하나의 끝을 지향한다.
발자국 소리는 기억 속에서 메아리친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따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을 향하여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What might have been is an abstraction
Remaining a perpetual possibility
Only in a world of speculation.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Footfalls echo in the memory
Down the passage which we did not take
Towards the door we never opened
- T. S. Eliot, 「Burnt Norton」, 『네 개의 사중주 Four Quartets』(1943) 중에서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을 참 재미있게 읽었기에 기대를 갖고 펼쳤다(알라딘에서는 지은이 표기가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로 달라서인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서지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고 분류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작가들도 어처구니없는 오기, 누락, 단절, 잘못된 연결이 이따금 보인다. 인터넷서점으로서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조금만 신경 쓰거나 찾아보면 방지할 수 있는 실수들이어서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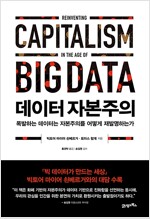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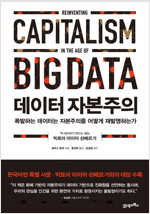





2009년에 처음 나와 문제의식을 앞장서서 이끌던 책이다 보니, 지금 읽으면 고민이 설익은 느낌이 난다(번역본도 2011년 7월에 초판 1쇄가 나왔다가 2013년 7월에 개정판이 나왔다고 책 앞장에 써있는데,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알라딘에도 개정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지은이가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도 새로운 걸 원체 잘 버무려내는 분이라, 취할 부분들이 없지 않다.
참고로, 요즘은 어법에 맞게 주로 '잊힐 권리'로 옮기는데,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지은이의 2007년 논문부터였다.
Viktor Mayer-Schoenberger, "Useful Void: The Art of Forgetting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KSG Working Paper No. RWP07-022 (April 2007).
https://ssrn.com/abstract=976541
이따금 썼지만, 최신 논의는 (외국에서) 논문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학문적 토론을 거쳐 단행본으로 갈무리되고, 좋은 옮긴이를 만나 번역되기까지를 기다리기보다, 그때그때 따끈따끈한 논문을 바로 읽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8년경부터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동안 논문이 적잖이 나왔다.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유럽이다. 2012 GDPR(안)에 상세한 규정이 들어가고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이 나오는 등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위 판결에서 ECJ는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게재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정보주체 이름으로 검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와 그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음이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사건 판결문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12CJ0131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수천 년 동안 기억과 망각 사이의 관계는 분명했다. 기억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들었기에, 인간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추려야 했다. 즉, 기본값(default)은 망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기억과 망각 사이의 균형을 역전시켜 기억하는 것을 잊는 것보다 손쉽고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왕창 찍은 사진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떠올려 보라). 게다가 이 기억된 정보들은 전지구적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까지 하게 되었다.
사회적 망각과, 기록의 제도적, 의식적 삭제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간과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간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배웠고, 스스로 행동을 고쳤다. 그러나 디지털 메모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탈출 불가능한 시간적 원형감옥((temporal Panopticon)이다.
보르헤스가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고(망각하고), 일반화, 추상화하는 것이다." 망각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여 일반적인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영원히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닻 내려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완벽한 기억은 숲이 아닌 나무들만 보도록 하는 저주이고, 사라지지 않는 잡동사니 정보의 불협화음이다. 디지털 기억은 망각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고, 개인과 사회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상황 대응 능력을 위협한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정도로만 요약한다.
지은이는 디지털 기억으로 인한 망각 실종 사태에 대한 잠재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북플에서는 표 형태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 |
정보 권력
(정보 프라이버시 포함) |
인지, 의사결정, 시간 |
| 개인 |
디지털 금욕주의 |
인지적 조정 |
| 법률 |
프라이버시 권리 |
정보 생태계 |
| 기술 |
프라이버스 DRM |
완벽한 맥락화 |
그리고 '정보 만료일'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망각 개념을 재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오늘도 알라딘에 미래의 족쇄가 될 수 있을 흔적을 많이 남겼다. 알라딘 자체의 내부 콘텐츠 검색기능이 그리 세련되지 않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