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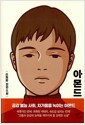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여기 두 소년이 있다. '윤재'는 생일날 엄마와 할머니가 눈앞에서 피를 뿌리며 죽고 다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소년. 또 다른 소년 '곤이(이수)'는 소년원 출신의 작은 깡패지만 죽어가는 엄마의 품에 영원히 안겨볼 기회를 빼앗겨 우는 소년이다. 두 소년은 어떤 의미에서 상통하는 괴물이다. 이야기는 윤재의 시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다.
기묘한 인연으로 만난 둘, 비유하자면 윤재는 돌같이 무딘, 선천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였고, 곤이는 여리지만 자신의 본질을 숨기려 온 힘을 다해 불같이 길길이 날뛰는 아이였다.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소년의 사이를 우연찮게 곤이가 먼저 비집고 들어온다. 윤재에게 몇 차례 폭력을 퍼붓고 나서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사이가 된다.
작품 속 '아몬드'는 뇌 속 편도체를 뜻한다. 윤재는 어떠한 연유에선지는 몰라도 편도체가 작은 데다 뇌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아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반적인 감정 불능은 매우 드문 케이스. 그런 윤재를 두고 할멈은 '예쁜 괴물'이라 불렀고, 있는 그대로의 손주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그대로 사회에 내보낼 수는 없었기에 엄마와 할멈의 협동 교육으로 윤재는 감정을 '외우게' 된다. '희노애락애오욕'을.
엄마가 그토록 바라는 평범, 정상 범주 안에 들기 위해 꾸준히 학습한 결과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다. 선천적인 결핍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으므로. 엄마와 할멈이 부재한 시점부터는 더더욱. 그러나 소년은 점차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
곤이가 윤재 앞에서 일부러 나비를 짓이기는 에피소드가 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무엇이라도 느끼길 바라며 일명 '공감 교육'을 시도한 것이다. 타인의 고통, 죄책감, 아픔 등을 작은 나비로 보여주려 한다. 결과는 실패로 끝나지만, 윤재는 곤이의 여린 내면을 조금 더 읽어낼 수 있었을 거다. 나는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외로웠어. 이 나비처럼 세상에서 버려졌어. 곤이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윤재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두 소년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성장'이다. 어찌 보면 성장소설의 뻔한 전개라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는 작품을 성장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가지런히 두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작가는 방관자다. 폭발을 앞둔 것 마냥 뜨거운 아이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무(無)의 온도를 가진 아이. 두 캐릭터를 창조해 활자 속으로 풀어놓았을 뿐.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작은 괴물이 서로 어떻게 각자 내면을 부수고 나오는지, 어떻게 서로를 보듬는지를 보여주기만 할 뿐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장이 있다. 『데미안』 속 문장이다. 두 소년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재는 자신 속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고 이야기한다. 곤이의 내면에서도 처절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세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두 소년이 부수고 나온 세계는 과연 어떤 풍경일까. 나는 다만 두 소년이 새로운 세상에서 작게 나마 안온함을 느끼기를, 조금 더 다채롭기만을 바란다.
여담 1. 이야기 속에는 많은 문학 작품이 숨어있다. 엄마가 꾸린 공간이자 윤재의 집이었던 헌책방이 배경이기에 책들은 자연스레 얼굴을 비춘다. 글자라곤 지나가는 건물의 간판을 보는 게 전부였던 할멈이 재미있게 읽은 유일한 책인 『현진건 단편선』 속 「B 사감과 러브레터」 등.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작품을 유추해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
여담 2. 작가는 사회학과 철학,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수많은 단편 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첫 장편소설은 성장 일대기를 담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준다. 한 편의 장편소설이 아닌 잘 짜인 시놉시스를 읽는듯한 느낌까지 들게 한다.
곤이가 교실과 피자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장면이나, 철사가 윤재에게 무시무시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액션 영화의 문법으로 읽혀도 나쁘지 않다. 곤이와 윤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도 무척이나 톡톡 튀어 재미있다. 소설 속에 이처럼 선명한 캐릭터들이 등장한 건 오랜만이었다.
여담 3. 나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영화 <파수꾼>이 떠올랐다. 윤재와 곤이를 보며 영화 속 소년들을 떠올려보던 와중에 『호밀밭의 파수꾼』 이야기가 한 문장 정도, 짧게 툭 튀어나왔다. <파수꾼>은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영감을 얻은 제목이다.
책 속 밑줄
영상 속의 이야기는 오로지 찍혀있는 대로, 그려져 있는 그대로만 존재했다. (…) 내가 그 세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책은 달랐다. 책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 pp.37-38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나같이 뭔가가 고장 난 사람이나, 죽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만이 그럴 수 있다. 아저씨는 후자였다. --- p.84
책방은 수천, 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구 밀도 높은 곳이다. 그러나 책들은 조용하다. 펼치기 전까진 죽어 있다가 펼치는 순간 이야기를 쏟아 낸다. 조곤조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 p.111
우리는 칠판지우개나 분필처럼 그저 학교를 구성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거기서는 누구도 진짜가 아니었다. --- p.117
여름은 그저 봄의 동력을 받아 앞으로 몇 걸음 옮기기만 하면 온다. 그래서 나는 5월이 한 해 중 가장 나태한 달이라고 생각했다. 한 것에 비해 너무 값지다고 평가받는 달. 세상과 내가 가장 다르다고 생각되는 달이 5월이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게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빛난다. 나와 누워 있는 엄마만이 영원한 1월처럼 딱딱하고 잿빛이었다. --- p.128-129
삶이 장난을 걸어올 때마다 곤이는 자주 생각했다고 한다. 인생이란 손을 잡아주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 p.142
―사랑. / ―그게 뭔데? / 엄마가 짓궂게 물었다. / ―예쁨의 발견. --- p.153
행간을 알고 싶었다. 작가들이 써놓은 글의 의미를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 p.177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둑이 터졌다. 울컥. 내 안의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 구역질이 났다. 떨쳐 내고 싶은 역겨움이 밀려왔다. 그런데도 멋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p.211
탕, 어디선가 출발 신호가 공기를 울린다. 우리는 지면을 밀어내며 달리기 시작한다. 시합이 아니라, 그저 달리기다. 우린 그냥 몸이 공기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 pp.2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