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은 근대적 기획이다. 칸트 이래로 세계상(weltanschauung)이란 용어는 철학계에서 널리 쓰였고, 19세기 후반쯤에는 지식사회에서 상용어쯤으로 간주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지식사회에서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내면세계'나 '종교적 심성', 혹은 '초월의 영역' 같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방어하였다. 이런 공적-지적 영역에서의 전면적 퇴각에 대한 반발이 1893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오어에게서 "기독교야 말로 참된 세계관이다"라고 터져나오거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프린스턴대의 스톤강좌(1898)에서 같은 포인트를 강조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이 '내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세상에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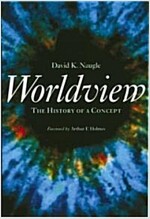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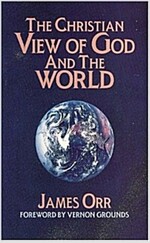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관'이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 개념사를 연구한 데이빗 노글(David Naugle)의 책<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은 번역 대기 중으로 듣고 있다. 이 책이 나오면 이 논의가 상당히 이론적 전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오어(James Orr)의 책은 저작권 문제가 풀려서 그런지 검색해보면 여러곳에서 책으로 낸 것으로 보인다. 여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저 버전이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은 크리스찬다이제스트에서 1996년 출간한 것밖에는 없고, 알리딘에는 표지 이미지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간략히 소개한 리처드 마우의 책 <아브라함 카이퍼>(SFC출판부)로 대신한다. 칼빈주의 강연도 저작권이 풀려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제대로 깔끔하게 출판해주어도 좋겠다. 혹은 크리스찬다이제스트가 책을 재정비하든지...
2.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시킨 첫번 공신을 꼽으라면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IVP)이다. 이 책은 영문판이 1976년에 처음 나왔다. 한글판은 1985년에 나와서 초판 18쇄, 2판(1995) 16쇄를 찍고, 제3판(2007)이 나와있다. 그 사이 영문판은 4판(2004)을 내어놓고 있다.


이 책은 그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상체계를 단순비교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있고, 전형적인 명제주의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이어는 이런 문제제기를 귀담아 들으며 이에 답하고자 <코끼리 이름짓기(Naming the Elephant)>란 책을 냈다. 번역본은 초판에 기반하고 있는데, 영문판은 개정판이 나왔는데 훨씬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빨리 번역되면 좋겠다. 그는 여기서 심지어 '기독교 세계관' 용어를 찰스 테일러의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이란 용어로 바꾸자는 파격적 제안까지 한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이 책이 빨리 번역되어 여러 사람들이 접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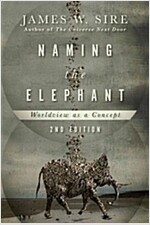
3.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본산은 네덜란드 개혁주의(Dutch Reformed) 전통이라고 할만하다. 사실 이 전통 외부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세계관'이란 용어를 그다지 널리 쓰지 않고, 오히려 '신학'이란 표현을 선호하는 듯하다. 개혁주의 전통의 세계관 이해를 대표하는 책으로는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이 널리 읽혔다. 영어판은 1985년 초판, 2005년 개정판이 나왔고, 번역본은 1992년에 처음 나와 개정판이 2007년에 나왔다. 개정판은 본문에는 개정이 없고,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의 후기가 첨부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 제기되었던 세계관 논의에 '성경 이야기'가 빠져있고, '선교'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논점을 수용했다.


4.
기독교세계관 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거점은 리처드 미들톤과 브라이언 월쉬의 작업이다. 이 콤비는 <그리스도인의 비전(Transforming Vision)>을 써내서 세계관 입문서로 널리 읽혔다. 영문판이 1984년에 나왔고, 번역이 1987년이니 상당히 빨리 소개된 셈이다. 이들은 10년후 이 책의 개정판을 내게되는데, 자신들의 전작이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내러티브'의 중요성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책을 쓰기로 한다. 이렇게 나온 책이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1995)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전작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시간 후인 2007년에 와서 번역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종교다원주의'쯤 되는 더티워드(dirty word)가 되어있던 한국 기독교 상황에서는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들의 두번째 책을 접하고서 이 논의가 빨리 국내에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경로로 추천과 격려를 많이 했다. 나는 이들의 논의가 제대로 평가되고 수용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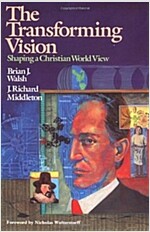


이 두 저자는 각각 저술을 내기도 했는데, 앞서의 책들도 작정하고 읽다보면 너무 인용이 많고 장황한 느낌이 있다. 각자 쓴 저술은 좀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후 미들턴은 성서학자의 길을 걷고있고, 월쉬는 성경에 바탕을 두되 좀더 문화비판적인 저술을 내놓고 있다.
리처드 미들턴은 창세기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비중있는 성서학 저술 <해방의 형상>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담아내는 <새 하늘 새 땅>을 출간했다. 세계관 논의가 성서학의 최근 성과와 깊게 연결될 수 있는 묵직한 저술이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에게는 좀 버거운 학술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브라이언 월쉬는 골로새서를 현대사회와 엮어서 전복적으로 읽어내는 <제국과 천국(Colossian Remixed: Subverting the Empire, 2004)>(IVP, 2011)이나 '바벨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란 부제를 단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Subversive Christianity, 1994)>(새물결플러스, 2010)를 썼다. 그의 관심사는 훨씬 더 '제국의 포로' 상황이란 인식에 가 있는 듯 하다. 나는 월쉬의 이런 인식은 톰 라이트와의 교감 가운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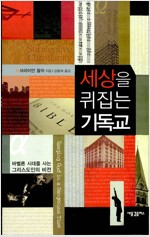
5.
나는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주요한 흐름은 대략 위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흐름에 속하면서도 어긋나는 한 흐름이 있으니 바로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의 기여이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좀더 근본주의적 성향에 가깝지만, 개혁주의 전통의 세계관 논의와 접목되는 지점이 적잖게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L'abri Christian Fellowship)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 변증활동을 해왔고, 문화와 예술 분야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영역으로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낙태반대운동 등을 통해 윤리운동을 강하게 전개한 바 있다. 그의 말년은 좀더 미국중심주의와 우파 애국주의 성향을 보여 여러 사람을 아쉽게 만들었는데, 그의 이런 스탠스로 인해 미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정치사회적으로는 공화당 혹은 우파운동과 친화성을 띄는 구조적 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쉐퍼는 '낙태반대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 교계 인사들이 아쉬워했다는 후문도 있다. 스위스 라브리를 다녀간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훨씬 문화적으로 급진적인 이들이 많았던 탓이 아닌가 보기도 한다.)
그의 저술은 이제 전집으로 다 묶여 있는데, 찾아보니 원래 나오던 <생명의말씀사> 전집(1995년판)이 2009년부터 업데이트 되고 있는 듯한데, <크리스찬다이제스트>에서 별개로 전집(2007)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어느 정도 다른지 비교해볼 여력은 없어서 더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두 출판사에서 그의 전집을 각각 내야할 만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지 나는 좀 의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 상황인데, 점점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의 종수는 늘어가는 듯하다. 그러나 뚜렷한 존재감을 갖는 저자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두 사람을 꼽아놓을 만하다. 한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자 나중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널리 알려지는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이다. 그리고 쉐퍼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콜슨의 방송 프로그램 작가로 활약하였던 낸시 피어시(Nancy Pearcy)가 있다. 이 두 사람이 현재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관 관련 저술가로 볼 수 있다.


찰스 콜슨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라디오 방송을 오랫동안 했는데, <대중문화속 거짓말>은 그 방송에서 다룬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평을 모아놓은 것이다. 목차만 훑어봐도 그의 입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800쪽이 넘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How now shall we live)?>는 제목 자체도 쉐퍼의 책에 대한 오마쥬를 담고 있다.
한편 낸시 피어시는 <완전한 진리>와 그에 이은 <세이빙 다빈치>로 업그레이드된 쉐퍼 버전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찰스 콜슨뿐 아니라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 진영의 언론홍보 담당 역할까지 맡은 바 있어, 이 논의의 주요한 한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미국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아마도 종교사회학자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dson Hunter)에게서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의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Late Modern World, 2010)>(새물결플러스, 2014)은 보수 기독교계의 여러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시도들이 그 말에 비해 성취도가 보잘 것 없고, 근본적으로 구조변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산발적 시도에 불과하다는 매우 괴멸적 평가에 책 한권을 통째로 바쳤다. 그의 평가가 충분히 공정하였는가, 그의 결론인 '신실한 현존(faithful presence)'로 충분한가는 논란이 있겠으나 이 작업을 위해 그가 수집한 자료와 막대한 데이터, 비판의 논리는 향후 어떤 기독교적 세계변혁 시도가 있더라도 필히 참고하고 극복해야 할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 단단한 논의라 쉽지는 않았으나, 매우 중하게 읽었다.

6.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여전히 세계관 논의가 흥미롭게 그 내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유력한 차세대 대안으로 부각되는 몇가지 흐름을 꼽아 보자면...
IVF 간사 출신이자 문화비평과 변혁에 창의적 통찰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앤디 크라우치(Andy Crouch)가 있다. 그의 <컬쳐 메이킹(Culture making, 2008)>(IVP, 2009)은 그의 내공과 시야가 결코 좁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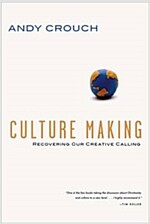
칼빈대의 제임스 스미스(James K. Smith)가 있다. 그는 현재 복음주의권에서 참고할만한 학자들 가운데 가장 활발히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을 섭렵하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생산해내고 있다. 빌라노바대학에서 자크 데리다 연구자인 존 카푸토에게 배웠는데, 그가 쓴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와 <급진 정통주의 신학(Introducing Radical Orthodoxy)> 등은 소개가 되어 있지만, 세계관과 관련한 그의 중요한 저술 시리즈는 아직 번역 대기 중이다. 그는 인식론 중심의 세계관 논의 구도가 바뀌어야 하며,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바 '사랑의 언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욕망(desire)이 주요한 주제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는 사랑의 표현을 배우고, 전수하는 '예배'라는 장이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문화적 예전(cultural liturgy)'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독교 신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맥락에서 예배(worship), 세계관(worldview), 문화적 형성(cultural formation)은 하나로 가야 할 주제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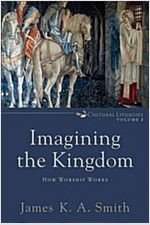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임스 스미스가 쓴 <How (Not) to Be Secular: Reading Chrles Taylor>(2014)가 그 통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속성(secularity)'에 천착해온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논의가 세계관 담론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의 주저 <A Secular Age>(2007)를 비롯 '세속성'과 '세속사회'에 대한 연구는 역설적으로 종교에 본질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 언급한 제임스 스미스뿐 아니라, 제임스 사이어도 테일러의 논의가 '세계관'이란 개념을 대치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을 과감히 내어놓았다. 독자적 용법과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으나, 만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찰스 테일러의 제안에 근접한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