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김신회 지음 / 놀 / 2018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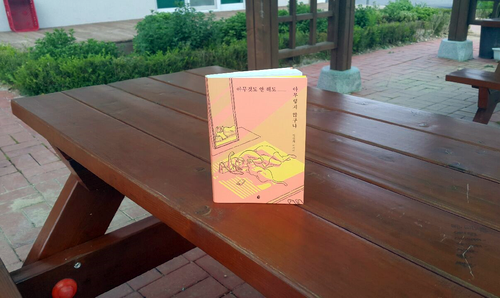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안심시켜주는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구나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 생겼다. 나의 불안과 세상을 향해 가지는 무서움에 안심할 수 있도록, 괜찮다는 말을 대신 보내는 눈빛이나 단어, 끄덕임 같은 제스처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한다. 마음에 깊게 자리한 불안함이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가끔 오후의 나른함을 참지 못해 심하게 졸릴 때가 있는데, 잠깐 졸거나 낮잠을 자도 괜찮을 순간인데도, 낮잠을 자는 걸 피한다. 이상하게 낮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이 시간이 잘 시간은 아닌데 왜 그랬지? 싶은 후회. 보통은 잠깐의 낮잠 후에 개운함이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늦은 점심을 먹고 둘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친구는 개운하다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는데, 나는 눈을 뜨고 나서 괜한 불안함을 느꼈다.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여건이 되면 낮잠도 잘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언짢아하느냐고... 그랬다. 살면서 오후의 졸음을 그대로 소화하며 낮잠을 잘 수도 있는 건데,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낮잠을 자서는 안 될 것 같은 긴장감이 들 때가 많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에서 감히 낮잠이라니!
요즘 나는 계속 화가 난 상태였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하고 찾아낼 기력이 없을 뿐 이유 없는 분노가 어디 있을까. 막연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면서 대체 왜 이러나 싶은 날들이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기. 그럴 때는 꼭 그렇게 방어적이 된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른다. (138페이지)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를 독촉하면서, 걷지 말고 뛰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휴식은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여유롭게 뭐가 많이 채워졌을 때, 내일의 걱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계획에 없던 휴식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도 더 악조건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순간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 휴식이 마음을 편하게 할 리 없다. 저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확실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일을 쉰다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때, 본의 아니게 쉬어야만 했던 시간에 겪은, 마음의 기록이다.
저자는 휴식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말,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고...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멘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빠듯하게 시간을 쪼개며 살아온 사람에게 1년여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동안 익숙했던 몸의 바쁨과 조급증은 어떻게 해치우고 1년을 보냈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 얼마간의 휴식을 보내게 되면서,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다는 저자의 이야기에, 어쩌면 이런 감정은 우리 스스로 겪고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말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것, 나를 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 내 안의 감정 속속들이 바라보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둬두기만 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된 거다. 달리지 않고 걷는다고 뭐라고 할까 봐, 때로는 그냥 뒹구는 게 욕먹을 짓일까 봐, 게으르다는 핀잔을 들을까 봐. 타인에게 들려오는 많은 말과 시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공감의 일탈이다. 이런 휴식을 일탈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불편하지만, 마땅히 어울리는 단어를 찾지 못하겠다. 단지, 이게 일탈이라면, 이런 일탈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자꾸만 삶에 대해 미련이 는다. 딱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처럼 벌벌 떨게 된다.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나중에 더 긴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는지를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움직이는 게 두렵기만 한 걸 어쩜 좋을까. 이럴 때마다 내가 철들었다는 걸 느끼고, 그런 내가 별로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멋진 사람들을 흘끗거리며 부러워하기만 한다. (262~263페이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고 반성해보자는 말만 하는 건 아니다. 안쓰러운 나를 보듬어주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 우리 이제껏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십 년 이십 년을 보내면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일상을 지켜냈는지 묻고 싶게 한다. 그렇게 저자는 1년여의 시간을, 일을 생략한 평소와 같이 보냈다.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 자기 말과 행동도 여전했고, 때로는 무료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을 테지. 그때마다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적어나갔다. 왜 그랬을까, 혹시 그때 잘못 말한 건 아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순간들의 기록. 하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마주 본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문득문득, 저자의 말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곤 했다. 특히 나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달랐던 말과 행동을 떠올렸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공감을 구하게 되면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게 되는 자기 단속. 특히 타인을 대하면서 나를 단속하는 순간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런 표정으로 속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나를 탓하고 단속하는 게 맞는 거라는 순간들을 떠올렸다. 왜 자꾸 나만 다그쳤던 것일까, 왜 나에게만 그렇게 너그럽지 못했던 것일까, 그 순간 가장 상처받고 아픈 사람은 나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것과 같다. 나의 몸과 마음, 기분이나 생각을 스스로 돌보면서, 내 맘과 같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입력해야만 한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괴롭히면서 장착하려고 했던, 조바심이나 기대치는 잠시 넣어두고,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인 나 자신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기로 한다.
때로는, 시체처럼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휴일의 오후가, 집으로 들어가는 저녁에 손에 쥔 매운 떡볶이 한 봉지가, 개운하게 씻고 난 후 맥주 한 캔이 우리에게 내일을 버티게 한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같은 소소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박함이 나를 관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한밤중의 야식에 살찔 걱정을 하지만 먹는 순간 행복하고,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 일어난 순간 휴일이 다 가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생각해보니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이렇게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별일 아니라는... 내일 또다시 달리면서 안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안하지 않게 느껴도 괜찮다고.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도, 횡단보도를 사이에 둔 건너편의 누군가도 이러고 사는구나,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