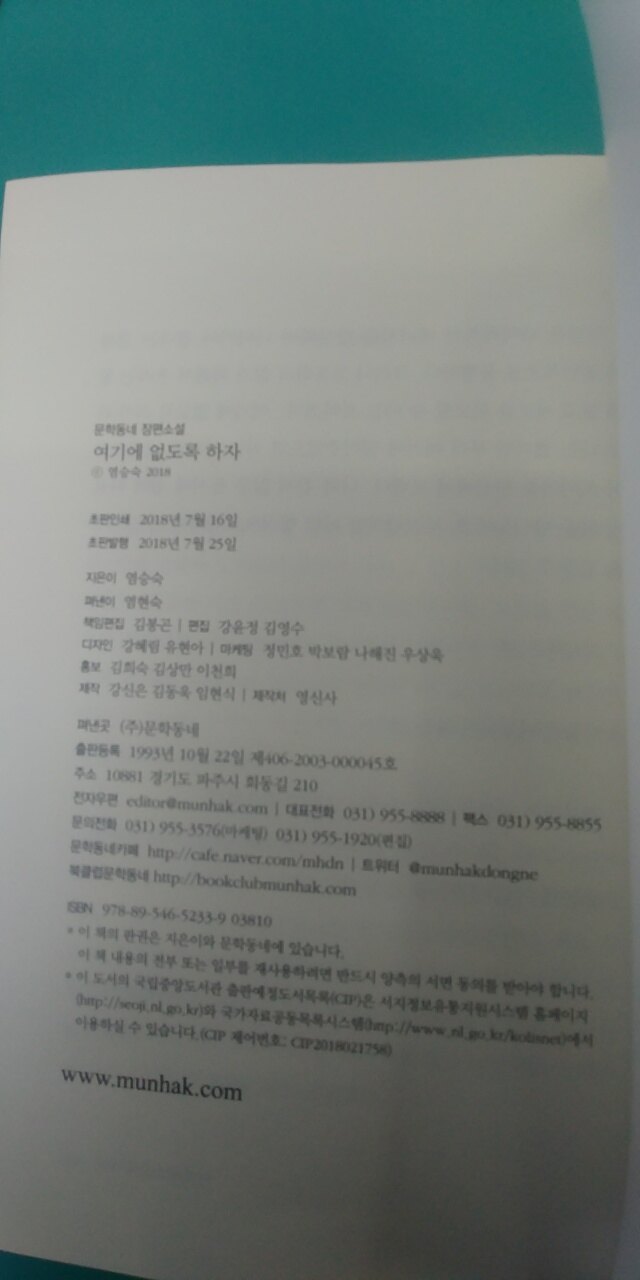-

-
여기에 없도록 하자
염승숙 지음 / 문학동네 / 2018년 7월
평점 : 


사실 9월 초에 제일 먼저 펼쳤던 책은 염승숙작가님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여기에 없도록 하자」였습니다.
제빙공장에서 대우받지 못하며 일하던 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추, 저처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추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만난 약의 제안을 받고 사설게임장에서 수십, 수백억을 따고 잃는 사람들 속에서 그저 가만히 서서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홀맨일을 하게 되는 데 물론 가만히 서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잃어 화가나고 억울한 사람들의 화풀이, 분풀이를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고통도 있지만 그만큼 두둑하게 받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프더라도 참아내며 버텨내는 추라는 인물을 보며 마치 저를 보는 듯했어요.
‘햄‘이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고 버텨내도 어쩔 수 없이 ‘햄‘이 되어버리는 청춘들의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한동안 책을 덮어버렸죠.
‘햄‘이라는 단어를 보며 약 20여일정도 일했던 무지개공단에 있는 파이프공장에서 저의 사수였던 6살 아래 동생이 저를 ‘햄(경상도 사투리로 형을 햄이라고 부른다는)!, 햄!‘으로 불렀던 게 생각납니다.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었고 적응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데 ‘가족이나 친구, 지인 간에 「친하다」는 표현은 서로 다정하며 친밀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략) 「잘 」안다,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면 더 위험합니다.
(중략) 인간에게 무지랄 게 있다면 바로 누군가와 친한 것을 두고 그 누군가를 안다고 여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친한 것은 친한 것이지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누구도요.(214~215쪽)‘ 와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 더 명징하게 가슴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감당 못할 빚과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생활비에 쪼들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태워도 결코 호락호락하게 길 터주지 않는 이 사회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밀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우리를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누구나 우리를 방치하고 방관한다.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는 듯이 우리는 다만 감춰져 있는, 장벽 뒤의 무리들인 것만 같다. 그런 취급과 대우를 받아왔다.(275쪽)‘ 같은 문장들을 읽으면서도요.
염승숙작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