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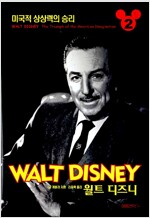

은근히 제목 정하기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무제, 라고 적기에는 너무 멋없어보이고, 그렇다고 번호만 붙이는 것은 왠지 성에 안차니 말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책들의 이름을 가져다 페이퍼의 제목에 붙이게 되는데, 만약에 제목이 정말 길거나 여러권을 써야 할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튼 이번에는 월트 디즈니와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정도이니 그럭저럭 제목에 적절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읽은 책은 이 책들말고도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끄적이고 싶은 마음을 - 긍정적이든 혹은 그 어느쪽으로든, 만든 책들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월트 디즈니는 그럭저럭 괜찮은 전이다. 평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평'의 부분이 약하다. 저자인 닐 개블러가 연구자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이기에 아마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다. 약간만 보완되었다면 정말 멋진 평전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좀 아쉽다. 대신에 전기라고 본다면 읽을만한, 그리고 재미있는 전기다. 월트 디즈니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일화를 수집해서 책에 녹여놓았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평전에서 '전'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독자에게 그 전기를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을 부여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독자는 정말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다던가, 라는 식의 그런 사소한 것에 흥분을 느낀다. (혹은 나만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을 엿본다는 그런 감각은 전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든다.
저런 원동력에 힘입어 사소한 이야기들마저도 시시콜콜하게 수집해서 그려내는 것이, 독자들에게 그 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줄 수 있다. 사실 이 명제는 얼핏보면 아이러니하다. 사소하게 나무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숲에 이르게 만든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이다. 어째서 가능한가? 이를 비유하자면 각종 게임에서 훈수를 두는 것으로 둘 수 있으리라. 늘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되면 정말 명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 하지만 남의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자신에게 파급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깊이 인지한다면 도리어 더더욱 길을 찾아낸다. 따라서 시시콜콜하게 나무를 수집하더라도, 그 나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땔감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독자라면 그 나무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라있는가, 곧 숲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 월트 디즈니 전에서는 너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동안 조금도 언급이 안되었거나 약간밖에 나오지 않은 인물의 입을 빌려 진행한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너무 뜬금없이 등장인물이 많아지는 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인명색인이라던가 주석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좀 더 나아질텐데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일수도 있다. 마지막에 번역자가 쓴 글을 보면 역자는 '임의로' 원작의 말미의 주를 통째로 빼버렸다. (월트 디즈니 2, 1217p.) 그 이유는 '지나치게 걸리적거리고 월트 디즈니의 삶을 조망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는 본문에 녹였다지만 글쎄, 이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인이 말한대로 '평전의 엄밀함' 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혹시 개정판이 나온다면 뒤의 주석을 제대로 번역하여 첨부하여준다면 분명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으리라.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는 괜찮은 책이다. 일단 표지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난세에 답하다, 와 비슷하게 생겼다. 한자어로 지봉유설을 써놓았으니 말이다. 저 책은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묶고, 그 외에 관련된 주제를 적은 다른 책들의 인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자가 머리말에 충분히 밝혀두었으니 어떤 모습인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다만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리 말해두자면 지적할 점만 있는 책이 아니고 상당히 재미있고 한 장씩 밤에 넘겨보면 괜찮은 책이다. 각 이야기가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다.
가장 먼저 지적할 부분은 이것이다 ; 저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너무 신뢰하는 것 아닐까? 약간 우스개처럼 보이는 이 문장은, 많이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55페이지에 보면 지봉유설에서 별에 대하여 인용하면서 청구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땅이름 -> 별이름, 이라고 한다. 원래 청구라는 땅이름이 존재했기에 말이다. 그런데 56페이지를 읽어보자. 두산세계대백과사전을 인용하면서 청구성이라는 별이름을 따서 청구라는 땅이름을 붙였다, 라는 상반된 주장을 가져온다. 두산세계백과사전에 따르면 별이름 -> 땅이름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조선상식문답, 에서 가져온다. 지봉유설과 두산세계백과사전을 나란히 놓아야 되는지도 일단 의문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각자 근거에 맞춰서 상반된 주장을 개진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을 그 근거로 말이다.
이에 대해 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서는 청구라는 말은.. ...라고 설명한다. 이로부터 이수광의 설명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57p.
왜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이 상반된 두 의견을 가리는 기준이 될까?
또 지적할 부분은 고추에 관한 부분이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저자는 고추가 임진왜란때 들어온 설을 부정하고 삼국시대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지봉유설에 따르면 고추는 임진왜란에 들어온 것이 맞다. 하지만 지봉유설이 틀렸다면? 여기서 저자는 이런 가설을 세운다. '고추는 고초가 변'한 말이므로, 용어는 실물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고초라는 한자가 중국의 어느 시대 문헌에 등장하는지 찾아보면 전래된 시기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가설 자체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용어가 실물과 함께 들어온다는 말은 사실 비약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고초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추가 아닌 매운 맛을 나타내는 식재품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것도 고초, 저것도 고초라면 꼭 고추가 전래되지 않아도 고초라는 말 자체는 퍼져나갈 수 있으리라. 백번 양보해서 저 가설을 따라간다고 하자. 저자는 결과적으로 문헌 검색상 삼국시대에 들어왔으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결론 자체도 잘못되었다. 고추의 야생종은 모두 남미산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어느 블로그 하나를 링크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다. http://hosunson.egloos.com/2296323 들어가보기 귀찮은 분을 위하여 설명하자면 고추의 기원은 중남미이고 콜럼버스가 발견하기전까지는 사실상 전래되지 못했으리라, 라는 것이 결론이다. 콜럼버스의 시기와 임진왜란의 시기는 얼추 비슷하니 도리어 지봉유설에서 이야기한 것에 힘이 실린다.
혹시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방명록에 남겨주기를 바란다. 여간하면 방명록은 훑어본다. 더이상 알라딘 서재페이지, 그러니까 인기글과 새글이 나란히 보이는 페이지에는 들르지 않지만 말이다. 결국에는 나는 바다에 병 속에 담긴 쪽지를 투척하는 소년이 된 것이다. 그 소년은 그 병에 담긴 쪽지가 누구한테 가서 닿든, 혹은 닿지 않든 던지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