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락 ㅣ 아르테 한국 소설선 작은책 시리즈
은모든 지음 / arte(아르테) / 2018년 12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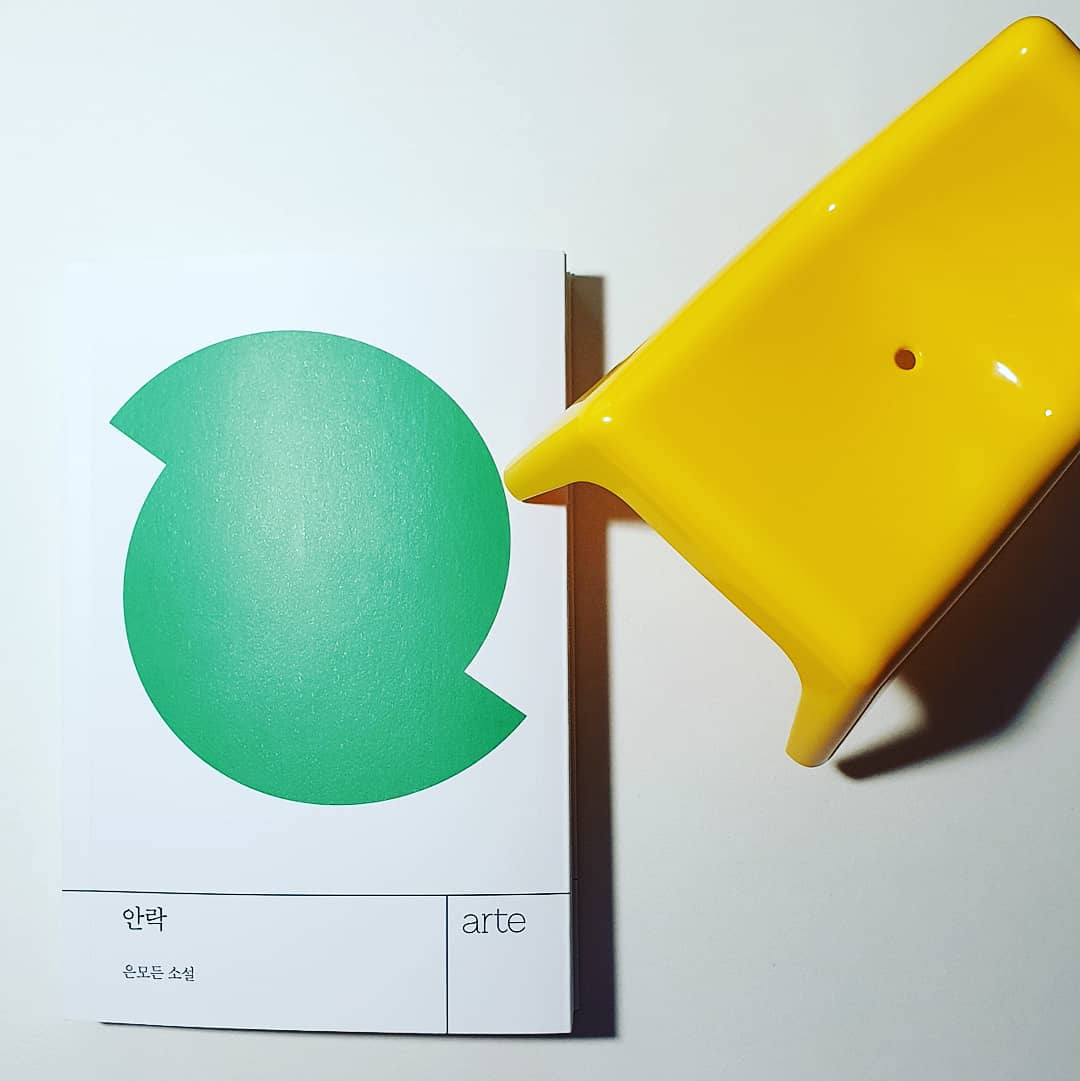
‘안락’이란 단어가 오래도록 남는다. 이 소설의 초반 부분에 주인공은 극장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게 된다. 다큐멘터리 속 소녀는 자신이 키우던 개의 아픔에 어렵게 안락사에 동의하게 되지만, 정작 그녀의 엄마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 소녀는 개에게 해준 일을 엄마에게는 해드리지 못한다. 끝까지 소녀를 두고는 절대 안 죽겠다던 엄마는 병을 이겨내겠다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반년 만에 세상을 뜨게 된다. 혼자 남겨진 소녀는 고백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에게 받기만 했다고, 엄마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말이다. 그런가 하면 어째서 자신은 두유에게 해준 일을 엄마에게는 해드릴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30p)
이 책은 주인공의 할머니가 앞으로 오 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개운하게 세상을 뜨고 싶다는 폭탄선언을 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안락사를 결심한 할머니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그러는 거냐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인공의 엄마 입장이 얽히고설킨다. 자식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계속 안락사를 고수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당뇨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다고 여겨왔는데 그것은 착각이더라고 했다. 지금은 하루 종일, 팔과 다리가 떨리거나 저리거나 쑤시지 않을 때가 한순간도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갈증에 시달리고, 약의 부작용인지 자주 메스꺼움을 느끼며, 시력도 전에 없이 나빠졌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가 해지고 찢긴 옷에 비유했다. 다 떨어진 옷을 억지로 기워 입듯이 매일 자신의 몸을 약으로 기워 나가고 있다는 거였다. (78p)
당뇨와 파킨슨병으로 왼쪽 다리를 끌 듯이 걷는 할머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아 옷을 적시게 되는 할머니,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젠 그만 두고 싶다는 할머니를 도대체 누가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나는 책 속 할머니 이금래 씨의 결정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버렸다. 엉엉 울면서도 차마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붙잡지도 못했다. 오래 전 암으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를 흠뻑 적신 이 소설이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던 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떠난 주인공의 할머니의 입 끝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