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이버 스톰
매튜 매서 지음, 공보경 옮김 / 황금가지 / 2016년 1월
평점 : 
절판

97년 1월, 주로 첨단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잡지 '와이어드'에 존 칼린이란 기자가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를 실었다. 그건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함께 지금까지 초강대국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전쟁 수행 양상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에서는 특정 상황 대응 전략을 만들기 위해 늘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펼쳐진다고 한다. 그 중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되는 것이 'THE DAY AFTER'인데, 이는 미국이 핵공격을 당하는 시나리오의 게임이라고 한다.
전략 게임이 빈번하게 치뤄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뜻일 것이다. 하긴 핵공격만큼 엄청난 것도 없을테니 그만큼 많이 수행되는 것엔 얼른 수긍이 간다. 그런데 말입니다.(김상중 톤으로...) 이제는 그 게임의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졌다고 한다. 뭬야~!, 핵공격 보다 엄청나서 그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시급한 게 있단 말이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마저 핵을 위한 미사일이라며 오도방정을 떠는 작금의 정부와 언론 현실을 보노라면 얼른 이런 의문부터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 공격은 무엇일까? 일단 게임은 이렇게 이뤄진다. CIA, FBI, 외국정책 전문가, 국방성 과학자, 국가안보국 지역책임자 등 각 파트의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모두 50명이 게임에 참여한다. 인원 규모나 참가자들 전문 분야를 고려해 보니 얼마나 이 공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더욱 느껴지는 것 같다.
아무튼 이들은 한 팀에 10명씩, 다섯 팀을 이루어 불과 24시간 안에 미국에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처 전략을 짜야 한다. 상황은 이러하다.
해킹으로 조지아 주의 통신 시스템이 다운된다. 덴버 시는 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뉴욕과 워싱턴 사이의 암트랙 철도는 마비된다. 신호 교란으로 열차 정면 충돌마저 일어난다. 로스엔젤러스 공항은 관제탑의 전산이 모두 망가져 이착륙을 비롯한 항공기 통제를 할 수가 없다. 항공기 추락도 시간문제다. 거기다 텍사스 기지 지하 창고에 보관된 폭탄들마저 불법 입력된 명령으로 폭발하기까지 한다.
자, 이만하면 얼른 떠오르는 대답이 하나 있을 것이다. 맞다. 바로 사이버 테러다. 이렇게 가장 많은 비범한 두뇌들을 가지고 자주 치뤄지는 대응 전략 게임마저 핵공격에서 사이버테러로 바꼈을만큼 세계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미 병기에 의한 물리적 공격보다 안보와 기반 시설에 은밀하게 들어와 통제권을 빼앗아가는 사이버 테러를 더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사 사회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통제되고 있으니 그렇게 여기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건 그렇고 아까 열거한 공격 상황들을 보노라면 얼른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지 않은가? 맞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영화 '다이하드 4.0'이랑 많이 비슷할 것이다. 그 영화도 사이버 테러로 뉴욕처럼 아무리 거대한 도시라 해도 얼마나 손쉽게 도시의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당연하다. '다이하드 4.0'의 시나리오는 존 칼린의 이 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사이버 테러로 뉴욕의 통제권을 빼앗는 해킹 집단의 리더로 분했던 저스틴 롱. 인터넷을 장악하면 아무리 소수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도시를 장악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영화에 '다이하드 4.0'이 있다면, 소설엔 '사이버 스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인 배경도 동일하게 뉴욕이다. '사이버 스톰'은 고유 명사가 아니다. 소설은 정체불명 해커 집단에게 잇단 기반 시설을 공격 받아 통신도, 전기도, 가스도, 물도 공급이 중단된 뉴욕의 혹한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뉴욕을 고립시키고 파괴시킨 두 상황,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와 때마침 불어닥친 거대한 눈 폭풍을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이버 스톰은 다이하드 같은 액션물은 아니다. 뉴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가장이 사이버 스톰을 맞아 가족의 생존도, 안전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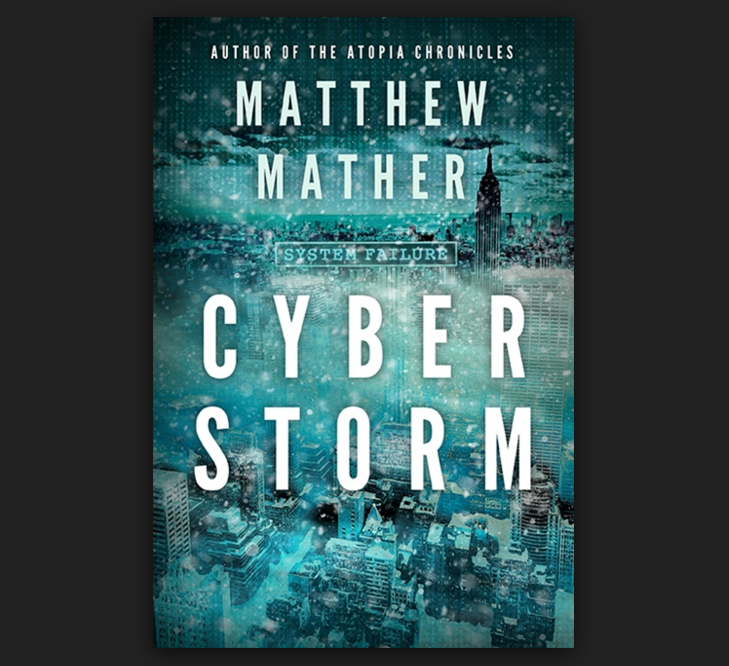
작가는 캐나다 출신의 매튜 매서. 사이버 스톰은 그의 데뷔작이다. 그는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엔 사이버 보안도 있다. 이 소설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고 그런 까닭에 소설이 그리는 사이버 테러로 인한 사회 혼란이 꽤 현실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작가의 특색이라고 한다. 무너진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고립되고 질병과 허기로 점점 파괴되어가는 인간 군상을 눈이 내리는 것처럼 차분하고 얼음처럼 냉정하게 그린다. 그래서 더욱 '혹시나 이런 일이 나에게도 닥친다면?' 하는 상상으로 공포를 느끼며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소설은 사이버 스톰이 시작된지 한 달 정도 지나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장면도 그리고 있는데 혹자는 이것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에 이 장면들은 작가가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쓴 것 같다. 스탈린그라드는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전투로 손꼽히는데 거기서 양쪽의 병사들은 전투가 길어지고 군량이 바닥나자 실제로 인육을 먹었기 때문이다. 스탈린그라드를 다룬 책 중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인 '피의 기록,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서 저자 안토니 비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굶주림은 정신과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개인의 사고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행동 패턴에서는 그대로 드러났다. (…) 루마니아 병사뿐 아니라 독일군 병사도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시체에서 살점을 얇게 잘라내어 끓인 뒤 ‘낙타고기’라고 하면서 나누어 먹었다. 인육을 먹은 자들은 금새 알아볼 수 있었다. 안색이 파리한 대다수 포로들과 달리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주 막나간 과장은 아니다. 시쳇말로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는가.
단 몇 달만의 허기로 인육을 먹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아주 허약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라캉에 따르면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내 욕망으로 믿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문명이 그토록 얄팍한 것이라면 그런 문명 안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겠다고 문명으로 총체화되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토록 나를 억누르고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꿈을 쫓으며 사는 것인지 의아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이버 스톰은 모든 재난 소설이 그런 것처럼 이전 문명의 상상적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오늘 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실마리를 준다고 하겠다. 거기서 내가 느낀 나를 둘러싼 삶의 껍질이 가진 두께의 크기에 따라 그것이 자유일 수도,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