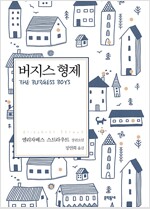
문학동네에서 <내 이름은 루시 바턴>에 이은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올해 나온 전작의 스핀오프로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어떤 것도 가능해:Anything is Possible>(2017)일 거라는 나의 추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새로 나온 작품은 2013년에 발표된 스트라우트의 네 번째 작품 <버지스 형제>였다. 어찌어찌하여 그녀의 팬이 되어 버린 독자는 단돈 147원으로 신간을 주문하는 신공을 시전하였다. 지금 배송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버지스 형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우선 작가의 홈피에 들어가 원서로 소개된 첫 몇 페이지와 오디오 파일로 들어 봤다. 세 명의 버지스 집안 사람들 중에 밥 버지스와 그의 형수 헬렌이 통화하는 장면이 귓가를 간질인다. 밀레니엄 캐피탈 뉴욕 시리(NYC)에서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는 잘난 형 짐 버지스와 그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역시 변호사 출신 동생 밥 그리고 쌍둥이 남매 수전. 30년도 전에 고향을 등진 짐과 밥은 어느 날, 소말리아 난민들이 신성하게 예배드리는 모스크에 얼린 돼지 머리를 건 19살 짜리 조카 재커리 올슨의 치기 어린 장난이 인종범죄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조카일병을 구하기 위해 거국적으로 단결해서 고향으로 향한다. 조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삼촌들이 그 정도 쯤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조카 구하기가 예상대로 쉽게 진행된다면 소설이 재밌을까? 없을까?

소설의 배경은 다시 1998년 작가의 데뷔작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미국 동북부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메인 주의 셜리폴스다. 작년에 나온 <에이미와 이저벨>은 57쪽까지 읽다 말고 회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가 셜리폴스를 찾아 보겠다는 아둔한 독자의 욕심에 다시 소환되었다. 아무래도 <버지스 형제>부터 읽고 나서 후순위로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 그런데 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에이미와 이저벨>부터 집어 들었다.
해외 리뷰들을 참조해 보니 소설 <버지스 형제>는 두 가지 축으로 굴러 간다고 한다. 하나는 가족이면서 가족 같지 않은 느슨한 연대로 구성된 21세기 미국의 가족 시스템 내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향 소말리아의 모가디슈를 떠난 난민들의 현지 적응화, 특히 9-11 사태 이후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한 이민천국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저널리즘을 능가하는 작가의 문학적 탐구라고나 할까.
실제로 2006년 7월 3일, 미국 메인 주의 루이스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작가는 영감을 얻은 모양이다. 작은 시골 마을의 9%에 해당하는 인구에까지 육박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원래 살던 이들의 반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흑인인데다 무슬림이기까지 하니 더더욱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브렌트 매튜스라는 청년은 사건 발생 전에 에릭 사이퍼스라는 경찰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물론 해당 경찰은 그 행동이 무단 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지만, 매튜스는 그저 장난(practical joke)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메인 주 검찰은 매튜스에게 경고명령장을 발부했고, 나중에 경범죄로 체포되었는데 그 사건이 매튜스에게는 첫 범죄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폭행, 음주운전 외에도 잡다한 전과가 있었다. 매튜스의 변호사는 연방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뤄지는 증오범죄가 아니고, 종교시설인 모스크를 알리는 싸인이 없었노라고 변론했지만 자신의 의뢰인이 그 정도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나 보다.
인구 35,000명 정도의 루이스턴 마을에 대규모로 소말리아 난민들이 유입되어 오면서, 유색인종 유입에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랠리도 기승을 부렸다. 알카에다 테러 이후, 피부색과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관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참고로, 브렌트 매튜스는 사건이 있은 뒤 몇 달 뒤인 2007년 4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루이스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의 죽음을 다룬 기사를 보니, 그를 농담꾼, 총기애호자(warm AK-47)라고 표현하며 최근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새로운 라벨이 붙었다고 한다. 기사를 읽다 보니 그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최근 미국에서 연달아 벌어지는 있는 무차별 총기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섬뜩한 생각이 엄습했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 유년 시절에 맞이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조카 때문에 발생한 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뭉친 짐과 밥 그리고 수전 버지스 가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한편으로 헬렌이 가족의 오점으로 생각하는 재커리 올슨의 인종범죄를 대하는 시선도 주목할 만하다. 과연 재커리가 한 행동이 무슬림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모스크에 걸어둔 것이 왜 하필이면 무슬림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머리였을까? 소나 양 혹은 염소 같은 다른 동물들도 있지 않은가. 무지의 소산이라고 하기엔 짙은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은가.
유투브에 나온 <버지스 형제> 저자와의 대담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hctgXjRzE2A) 도 저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찌해서 제목을 <버지스 남매>라고 하지 않고 ‘버지스 형제’로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 책을 쓰기 위해 메인 주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에 대해 방대한 리서치 작업을 했다는 설명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내전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캠프 등에 저자는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진행했다고 한다. 현실 세계에서 소말리아 난민들을 돕고 있다는 는 독자 중의 한 명이 미국에서 가장 백인주의적이고 오래된 메인에 그들이 정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자는 우선 미국이 몇몇 거점으로 삼은 곳이고 집세가 싸며, (조지아 주 같은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안전하다는 이유로 명쾌한 설명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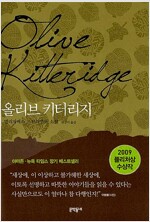
퓰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작가답게 글쓰기에 대해서도 한 수 알려 주었다. 항상 자신의 본능에 반대해서 글을 쓰고 캐릭터를 만들어라. 특히 캐릭터를 만드는데 있어, 흥미진진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코치해 주었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키터리지의 주인공처럼 호감이 가지 않는 캐릭터를 소설이 진행될수록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실력이야 말로 대가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을까. 대담을 들으면서 일가를 이룬 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결연한 자세 같은 것도 눈에 띄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는 의례적인 질문에 앨리스 먼로와 윌리엄 트레버를 정말 정말로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작가로 엘레나 페란테의 작품들도 섭렵하고 있다고. 물론 러시아 작가들도 꾸준히 읽는다고 했다. 한 10분 정도 남겨 두고 고만 보았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마저 볼 생각이다.
어쨌든 이상이 나의 <버지스 형제>를 읽기 전에 취합한 정보들이었다. 빨리 내 수중에 들어와서 읽어 봤으면 좋겠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 나는.

드디어 책 도착, 바로 읽기 시작했다.
유투브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읽으니 더더욱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에이미와 이저벨>도 읽어야 하는데 자꾸만 독서새
끼줄이 꼬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