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이름은 루시 바턴 ㅣ 루시 바턴 시리즈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7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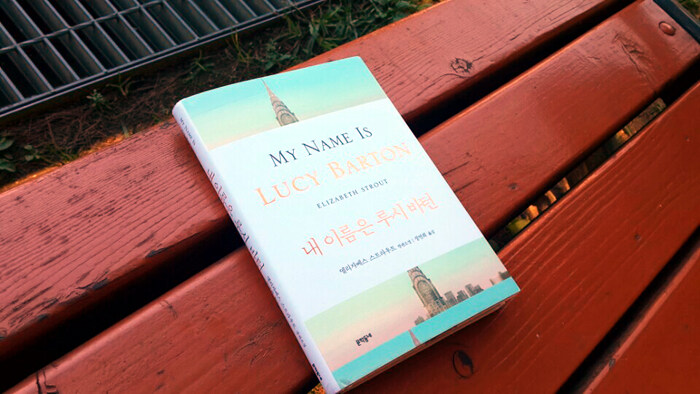
기다리고 있던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 마침내 도착했고, 기갈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읽어 내려갔다. 오늘 받았는데 벌써 다 읽어 버렸다. 그것은 마치 이 책을 다 읽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2016년 맨부커상 롱리스트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나서부터, 원서라도 주문해서 읽어야 하나 싶었지만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니 그저 번역이 돼서 출간될 날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도착했고 난 순식간에 다 읽어 버렸다.
소설의 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소설의 화자는 글쓰는 여자 루시 바턴이다. 일리노이 주 앰개시라는 촌동네 출신의 루시는 차고에서 자랐다. 텔레비전 한 대 없이 유년시절을 보낸 그녀는 추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따뜻한 학교 교실에 남아 숙제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게 진학한 대학에서 현재의 남편 윌리엄을 만나 결혼해서 뉴욕에 정착했다. 크리스티나와 베카라는 어여쁜 딸을 낳은 루시는 맹장수술 때문에 입원한 크라이슬러 빌딩이 보이는 뉴욕 병원의 1인실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
왜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작가가 병원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바로 병원이라는 장소가 치유와 회복의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수술에 의한 육신의 회복 뿐, 아니라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병원에 입원한 딸의 병간호를 위해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도착한 루시의 엄마의 모습에서 화해가 분위기가 느껴진다. 어쩌면 그것도 독자의 착각일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화해라기보다 어쩌면 갈등의 심화가 벌어질 수 도 있지 않을까.
소설은 마치 영화의 시퀀스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한 컷에서는 1980년대 중반 뉴욕의 병원을 무대로 하다가, 또 한 편에서는 화자 루시 바턴이 생각하는 과거의 이야기들에 포커스를 맞춘다. 독일군 포로 출신으로 메인 주의 농장에서 일하다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 자신의 남편 윌리엄을 낳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기묘한 러브스토리와 뉴욕에서 포닥 과정을 밟게 된 윌리엄이 35살의 나이에 독일에 사는 조부모로부터 상당한 양의 유산을 받게 된 이야기들이 줄지어 등장한다. 뜻하지 않았던 유산은 전쟁 중에 조부모가 번 돈이라고 하는데, 나치의 부정한 축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루시는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가스실로 끌려간 상상에 빠지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아주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
독자가 대면하게 되는 루시네 집안의 가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겨울에 실내에서도 코트를 입을 정도로 추웠다고 했던가.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엄마는 루시에게 핫보틀을 데워줘서 껴안고 잤다고 했지 아마. 루시네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차별은 만연했고, 사람이 많아서 바닥에 앉으라고 했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나눠 주는 풍족한 음식을 만끽했다는 이야기도. 나도 언젠가 얻어먹은 상상을 초월하는 터키 생각이 났다. 문제는 어떻게 먹는 줄 몰라서 그대로 상온에 방치했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더라는 이야기도. 참고로 미국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칠면조는 닭고기에 너무 뻑뻑했다.
유년 시절 지긋지긋했던 가난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모두 지워 버리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작가로 새출발을 하려는 루시 바턴에게는 그 일화들도 어쩌면 이렇게 소설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글감들이 아니었을까. 뉴욕의 첼시에서 우연히 만난 세라 페인과의 인연은 글쓰기 워크샵으로까지 이어지고,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그리고 독자들이 저자의 약점을 파악하기 전에 담대하고 결연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로서도 충고도 빠지지 않는다.
투펠로 출신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루시의 어머니가 사랑했다면, 루시는 자신의 이웃에 사는 예술가 제러미를, 병원에서 자신을 담당했던 과묵한 의사를 사랑했다. 신의 형벌이라던 AIDS가 만연하던 1980년대 중반에 대한 기술도 눈길을 끈다. 그리고 보니 루시의 오빠도 게이가 아니었던가. 대학 교육을 받은 루시는 고향을 탈출해서 뉴욕에 거주하는 성공한 작가가 되었지만, 언니 비키와 오빠는 그러지 못했다. 어엿한 도시인이 되었지만, 도시 생활 초기만 하더라도 루시는 도시인의 시골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도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엄마의 예언대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변의 관조하게 되고, 그런 민감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의 가난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예술 문화에 대한 상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는 루시의 고백에서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작가가 200쪽 남짓한 짧은 이야기 속에 시대를 관통하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찬란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행운의 번호 추첨으로 베트남전에 가지 않은 오빠 이야기로부터, 엄마가 전해준 고향에 사는 이들에 대한 최신 정보들, 병원과 주변에서 접하게 된 AIDS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한 단상들, 대학교육을 통한 일련의 성공과 신분 상승,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 자녀양육과 위기에 빠진 결혼생활 등 대가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그동안 작가가 되기 위해 글을 썼다면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을 통해 받았다.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싶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밀리 블런트가 루시 바턴 역을 멋드러지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지금까지 모두 6편의 소설을 발표했는데, 국내에 소개된 책은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 세 번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세 권이 더 남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올해 나왔다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작가 신작의 조속한 국내출간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