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을 ㅣ 앨리 스미스 계절 4부작 1
앨리 스미스 지음, 김재성 옮김 / 민음사 / 2019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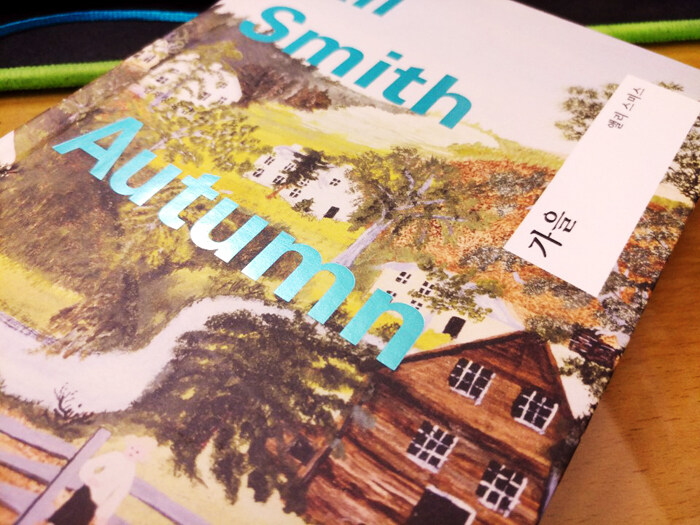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일까? 아니면 최근 들어 앨리스 먼로와 토바이어스 울프의 책들을 연달아 읽으면서 문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탓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으로 만나는 알리 스미스가 소설 <가을>에서 구사하는 내용에 대한 무지 탓일까? 유튜브에서 원어민 리뷰어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댔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나는 알리 스미스의 사계절 시리즈의 시작에 시작하는 <가을>에 연착륙을 실패한 모양이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많은 비밀을 가진 101세의 대니얼 글럭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소설이 시작되었던가. 광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댔듯이 소설 <가을>은 3년 국민투표로 결정이 난 브렉시트라는 희대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니 이 소설은 브렉시트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나 할까.
수십년 전부터 야심차게 기획된 유럽연합이라는 이상은 영국의 브렉시트 탈출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까지도 노딜이니 딜이니,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진행 중이니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유로 통합이 궁극적으로 독일 경제의 유럽 제패라는 근간이 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신구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는 EU 잔류를 그리고 노년 세대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다고 하던데...
대니얼 글럭 씨와 엘리자베스 디맨드 양의 69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 넘은 우정의 발단은 이야기였다. 알리 스미스는 대가다운 실력으로 오노레 드 발자크의 <나귀 가죽>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골디락스 스토리까지 도입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희망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물론 그에 대한 강력한 걸림돌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섭다는 걸 말해 주고 싶은 걸까. 왜 동성애자 노인이 자신의 딸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고, 자신에게도 하지 않는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지 그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방송을 통해 만나게 된 조이와 야릇한 관계로 빠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세상사, 알 수 없다는 거겠지만.
알리 스미스는 영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나같은 이방인 독자는 인터넷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최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을 무시로 등장시킨다. 나는 당혹스럽다. 이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읽기를 해야 하는 건가하고 말이다. 귀찮다, 그냥 읽자로 귀결이 된다. 그런데 1963년 영국 내각을 붕괴시킨 크리스틴 킬러의 재판 이야기를 비롯해서, 미술사학도로 영국 팝 아트의 시조새 같은 여인 폴린 보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 결국 리뷰를 쓰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급하게 찾아보았다.
엘리자베스의 꼰대 지도교수는 폴린 보티로 자신의 논문 주제를 변경하겠다는 발칙한 제자의 의견을 극력 저지한다. 사료가 없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뿌리 깊은 편견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 브렉시트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한몫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보통 사람들이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그야말로 혐오와 분노가 넘실거린다. 하긴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가. 알리 스미스는 브렉시트를 콕 짚어서 말하지 않는 정도의 여유를 보여 주지만, 나는 왠지 많이 불안해졌다.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의 모습에서,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연상되었다.

28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폴린 보티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녀가 활동하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단한 미녀가 똑똑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었다. 영국에서 여성 팝 아트의 시조라 불릴 만한 경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운의 삶을 살다가 갔다. 무시, 소실 그리고 재현을 거듭할 거라는 엘리자베스 엄마의 새로운 친구 조이의 지적이야말로 당대 여성 예술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녀의 작품 중에서 특히 엉덩이를 형상화한 <BUM>의 아우라는 정말 압도적이었다. 예술에 문외한이다 보니 좀 더 분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다.
영국 보수주의자들이 그야말로 아이돌처럼 떠받드는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치료하겠다고 민영화에 나섰다. 과연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가 경쟁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에 공언했던가? 대처가 죽었을 때, 국장을 치르면서 경쟁 발주 입찰을 하라는 시민들의 비아냥거림이 난무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대처가 말하던 영국병은 과연 치유되었을까? 엘리자베스가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신속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속이 터질 지경이다.
만연한 관료주의는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마구 잡아먹는다. 나도 예전에 외국에서 여권 갱신을 하면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영사관 직원의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오롯하게 나 자신을 엘리자베스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가 있었다. 하긴 서구에서 그런 엄격한 관료주의의 적용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었으니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말이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법률과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이 만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내가 언제 깨달았던가. 그래서 관료들은 그런 작은 오류 하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라는 걸 수 차례의 혁명을 통해 깨달아서일까 어쩔까.
리뷰를 쓰기 전에 알리 스미스의 <가을>이 나랑 맞지 않는 책이라고 판단하고 팔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해놓은 메모를 살펴 보니 일단 나머지 다른 계절들을 읽어 보고 나서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다른 알리 스미스의 책을 읽어 보고 나서 하던가. 이상이다.